거창군 지명 유래
출처 : http://www.geochang.go.kr/town/Index.do?c=TW0101030000
거창군 - 순서:
1 거창읍 2 가북면 3 신원면 4 남상면 5 위천면 6 고제면
7 주상면 8 가조면 9 남하면 10 마리면 11 북상면 12 웅양면
============================================================
우혜, 백학, 상감월, 중감월, 하감월, 은사동, 어인의 7개 마을이 있다.
공수, 박암, 호암, 옥산, 신기의 5마을이 있다.
몽석, 덕동, 내촌, 강계, 명동 등 5개 마을이 있다.
송정, 홍감, 용암, 상개금, 하개금, 장전 등 6개 마을이 있다.
불석동, 수재동, 심방소, 다전, 동촌, 산수동, 고비 등 7마을이 있다.
회남, 추동, 연곡, 월전, 양암 등 5마을이 있다.
용산, 율리 두 마을로 이루어졌다.
===========================================================
본면은 거창읍의 남쪽에 맞닿아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북서부에 청림방(靑林坊)이라 하여 한산리, 지하동리, 송변리, 청렴리 등 4개 리가 있었다. 남서부에 고천방(古川坊)이라 하여 무촌역리, 매산리, 동령리, 진목정리 등 4개 리가 있었으며, 남동부에는 남흥방(南興坊)을 두어 남흥리, 율정리, 사불랑리(沙佛郞里), 북죽리, 남불리 등 5개 리로 나뉘었던 것이 지금은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전척리, 임불리, 진목리, 춘전리 등 10개 리로 이루어졌다.
남진, 동령, 신기, 원둔동 등 4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둔동리는 원둔동 마을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옛 고천방에 따랐었고, 원오계 마을 이름에서 오계리 이름이 생겼다. 외등, 묵동, 원오계, 갈전 등 4개 마을이 있다.
조선시대 본면의 서남쪽에 자리했던 고천방에 있었던 무촌역을 중심으로 한 근방을 무촌역리라 한데서 리동 이름이 생겼다. 상매, 하매, 무촌, 인평, 성지, 지하 등 6마을이 있다.
청림방에 따랐던 마을이다. 솔숲이 울창하여 이름되었다고도 한다. 고려말 거제현이 가조에 옮겨와서 거제에 있어던 속현의 이름을 따라 송변현(松邊縣)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영조 36년(1760)에 만든 거창부여지승람에 고적 아주촌(古跡 鵝州村)이라는 제목 아래 잔글로 "거제가 가조에 와 있으면서 본 섬안에 있었던 속현과 역원을 가조 땅에 두었는데 아주현은 거창부의 동쪽 심리에 두고, 송변현은 무촌역 남쪽 오리에, 오양역(烏壤驛)도 가조의 서쪽에 있었으니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는다."라고 적혀있다.
조선시대 청림방에 따랐고, 대현 마을의 대자와 한산 마을의 산자를 따서 대산리라 하였다. 괴화, 이인, 한산, 가곡, 대현 등 5마을이 있다.
마을 뒷산인 낙하산이 반달 모양이고, 앞에 넓은 우암들이 있으므로 월평 이라 한다. 옛 남흥방에 따랐으므로 남흥이라고도 하였다. 월평과 평촌 두 마을이 있다.
전척, 괘리, 명산동, 고척 등 4마을이 있다.
옛날 남흥방에 따랐고, 본면의 동쪽끝에 자리하여 북쪽은 황강으로 남하면과 경계하고, 동쪽은 합천군 봉산면, 남쪽은 신원면에 맞닿는다. 임불, 남불, 월포, 세 마을이 있다.
임진왜란때 엄능(嚴陵)이라 하다가 뒤에 지금의 내춘을 중심으로 엄전(嚴田)이라 하여 "음지이"라고 부른다. 안의현의 황곡리(黃谷里)에 따랐었고, 안의면에 속하게 되어서 밭이 많은 곳이라 춘전이라 했다하며, 1973년에 남상면에 붙였다. 남영, 내춘, 외춘, 교동 등 4마을이 있다.
마을 가에 참나무가 많아서 진목, 진목지이라고 하다가, 1973년 안의면에서 남상면 진목리로 바뀌었다.
=====================================================
본군의 서부 가운데에 자리하여, 동쪽에 고제면, 주상면, 남쪽에 마리면, 북쪽에 북상면과 맞대이고, 서쪽은 금원산과 기백산의 산줄기를 경계로 함양군과 만난다. 북상면, 마리면과 함께 본군의 서부를 이루면서 가야, 신라, 고려때 염례, 남내, 여선, 감음으로 부른 행정구역으로써 그 치소의 소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면의 가운데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위천 냇물의 동쪽을 안의군의 북쪽 끝자리인 북상면에 이어서 북하면(北下面)이라 하고, 황상(黃山), 당산(堂山), 무어(舞於), 월치(越峙) 등 4개 리를 두었다. 위천 서쪽에 고려 때 감음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고현면(古縣面)을 두고, 거차(居次), 사마(司馬), 우곡(牛谷), 강남(江南), 상천(上川), 신계(申溪), 부곡(婦谷), 마항(馬項), 강동(薑洞), 역동(墿洞) 같은 10개 리가 있었다. 1914년 두면을 합하여 가운데 냇물의 이름을 따서 위천면이라 하였다. 지금은 장기리, 남산리, 상천리, 황산리, 당산리, 모동리, 강천리 7개 리로 되어 있으며 본 군 서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장기, 창촌, 사마, 거차 4마을이 있다.
옛날에는 우곡(牛谷里)에 따랐던 곳이며, 위천의 남쪽 끝 산밑에 자리하므로 붙인 이름이다. 남산동, 금곡, 호동, 가현, 화로곡 등 5개 마을이 있다.
본 면의 서쪽에 높이 솟은 금원산의 동쪽 기슭에 펼쳐진 곳이다. 상천, 서원, 덕거, 후방, 강남불, 점터 등 6개 마을이 있다.
원황산의 지형이 노루의 목과 같다하여 노루목이라 불리어 오다가 조선 중엽 이후 황토백산(黃土百山)에서 황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원황산, 어나리, 동촌 등으로 나눈다.
위천면의 동북끝에 자리하여 호음산에 매봉, 석부산, 취우령으로 동쪽 경계를 이루어서 고제면과 주상면에 맞대인다. 모전, 석동, 무월, 원당 4개 마을이 있다.
고려말 이예(李芮)가 살던 곳이므로 그의 호에서 마을과 앞 냇물의 이름을 강천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강동, 마항, 면동 등 세 마을이 있다.
============================================================
옛날 성초역(省草驛)으로 가는 길목에 한 도승(道僧)이 놓았다는 높이 6미터, 길이 11미터의 큰 돌다리를 "높은다리"라 하였는데, 이 다리 이름이 곧 면이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북창리(北倉里), 입석리(立石里), 개명리(開明里), 손항리(遜項里), 수다리(水多里), 성초역리(省草驛里), 둔대리(屯垈里), 임당리(林塘里) 8개 리가 있었고, 지금은 농산리, 개명리, 봉계리, 봉산리, 궁항리 5개 리로 나눈다.
본 군의 북쪽 끝에 자리하여 대덕산과 삼봉산으로 뻗은 소백산맥이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대덕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미는 가지는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룬다. 본 면의 동쪽은 웅양면, 서쪽은 북상면, 남쪽은 주상면과 맞 닿는다. 본 면의 복판을 북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 동쪽을 큰골이라 하며, 봉계리, 봉산리, 궁항리가 있고, 도마현(道磨峴)을 넘어 무풍(茂豊)에 이어진다. 서쪽 골짜기를 작은골이라 하며 개명리로서 빼재(秀嶺)를 넘어 구천동으로 통한다. 큰골과 작은골이 어울리는 본면의 남쪽 끝에 농산리가 있다.
본 면의 남서쪽 끝에 자리하여 주상면, 위천면, 북상면과 맞닿는다. 원농산, 금계, 입석, 손항, 온곡 다섯 마을이 있다.
본디 이 골짜기를 거문골이라 하였다가 300여 년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개명하였으므로 개명골이라 한다. 수유동, 괘암동을 개명리 1구, 2구에 개명골이 있고, 북쪽 끝에 물안실이 있다.
탑선, 지경, 소사, 원기, 원봉계, 내다 여섯 마을이 있다.
서북쪽에 솟은 두루봉이 봉황새 모양이라 봉산리라 한다.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네 마을이 있다.
고제면의 큰 골 남쪽 어귀에 자리하고, 북쪽에 학림, 동쪽에 원궁항, 남쪽에 산양이 자리 잡고 있다.
=============================================================
본 군의 중앙부에 자리하며, 조선시대에는 동쪽을 지상곡면(只尙谷面)이라 하여 성기역리(星奇驛里), 장생동리(長生洞里), 고대리(古大里), 보광리(寶光里), 도평리(道坪里) 등 5개 리로 나누고 면사무소는 도평리에 두었다. 서쪽은 옛 거창군의 큰 골짜기라 이르는 주곡면(主谷面)이라 하고, 연제리(連梯里), 완계서원리(浣溪書院里), 완서리(翫逝里), 오산리(烏山里), 오리동리(梧李洞里)등 5개 리로 나누고, 연제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가, 1913년에 두면을 합하여 주상면이라 했다. 연제리에 있던 면사무소를 1920년에 도평리에 옮겼다. 지금은 도평리, 연교리, 내오리, 완대리, 성기리, 거기리, 남산리 등 7개 리로 나누었다.
도평 1구의 도평과 봉황대 2개 마을, 도평 2구의 상도평 등 3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8월 14일 도평1구를 도평(道坪)으로 도평2구를 상도평(上道坪)으로 변경 하였다.
연교리에서 고제면 삼봉산(三峰山)까지 북쪽으로 트인 골짜기를 심원동(尋源洞)이라 한다. 옛날 큰길의 두 다리가 이어져 있으므로 연제리(連梯里)라 하고, 지상곡면의 면사무소가 생기면서 착실한 인심에 맡긴다는 뜻에서 임실(任實)이라 불렀다. 연교1구에 마을 가운데 도랑을 경계로 상임실(上任實), 하임실(下任實), 연교2구에 막터(幕基), 서잿골(書齋谷)등 4개 마을이 있다. 2006년 8월 14일 연교1구를 임실(任實)로 연교2구를 연교(連橋)로 변경 하였다.
내오리는 내오1구의 오무, 새터 2개마을, 내오2구의 오륫골 등 3개마을로 나누어지며, 내오리 이름은 오무마을 이름에서 생겨난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내오1구를 오무(鼇武)으로, 내오2구를 오류동(五柳洞)으로 변경 하였다.
완대 1구인 완수대와, 완대2구인 도동 완대3구인 넘터(완계) 3개 마을로 나눈다. 2006년 8월 14일 완대1구를 완수대(玩水臺)으로, 완대2구를 도동(道洞) 완대3구를 넘터로 변경 하였다.
옛날에는 별 '성', 이상할 '기' 성기(星奇)라 하였고, 성기역(星奇驛)이 있었다. 고려 때 주씨(朱氏)가 이룬 마을이라 전한다. 성기1구에 원성기와 홍석동, 성기2구에 신촌, 미기동, 성기3구에 송정, 희동 6개 마을이 있다. 희동에서 고려왕사 희랑대사가 났으므로 성스러운 분의 출신지라하여 성인 '성', 터 '기' 자를 써서 성기(聖基)라 고쳤다 한다. 2006년 8월 14일 성기1구를 원성기(元聖基)으로, 성기2구를 정동(停洞), 성기3구를 송희(松希)로 변경 하였다.
거기1구의 거기, 거기2구의 외장포, 내장포, 거기3구의 고대 등 4개 마을로 나눈다. 2006년 8월 14일 거기1구를 거기(渠基)로, 거기2구를 장포(長浦), 거기3구를 고대(古垈)로 변경 하였다.
남산1구의 남산동, 시락골, 남산2구는 덕동, 서변동, 남산3구의 상보광, 중보광, 개울보광 등 7개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2006년 8월 14일 남산1구를 원남산(元南山)로, 남산2구를 포덕동(飽德洞), 남산3구를 보광(寶光)으로 변경 하였다.
==========================================================
생초, 왕대촌, 평촌, 동산하, 도촌, 재동의 6마을이 있다.
양기, 음기, 광성, 학산의 4마을이 있는데 양기, 음기를 함께 텃골(基洞)이라 한데서 기리 라는 이름이 생겼다.
대초, 방촌 2마을이 있다.
안금, 중평, 동례 3마을이 있다.
역촌, 부로동, 모덕동, 장기, 원천, 신천 외 6마을이 있다.
병산, 창촌, 당동 3마을이 있다.
가조면 사무소의 소재지리 옛날 삼 농사를 많이 하여 마촌(魔村) 마치마라고 하였으며, 상마(上馬), 중마(中馬) 1구 중마 2구로 나눈다.
월포, 용당소, 상수월, 용전 외 4마을이 있다.
옛 상가남면에서 가동면으로 바뀌었던 곳으로 도산, 부산, 녹동의 3마을이 있다.
도산동, 화곡, 대학동의 3마을이 있다.
================================================================
대촌, 신촌, 안흥 3마을이 있다.
동호와 성북으로 나눈다. "됫뫼, 큰마"라고도 하였으며 1962년부터 대촌이라 하였다. 대촌마을은 1550년께 하빈이씨가 마을을 열었으며, 뒤쪽으로 해발 709m의 금귀산(金貴山)이 자리잡고 있으며 옛날 봉수대가 있어 봉우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산정의 남쪽편에 금귀사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북동쪽 300m에 있는 재궁골(梓宮谷)은 석장골(石葬谷)이라고도 하며 사적 239호인 둔마리 벽화고분이 있는 곳이다.
"뒷뫼새마"라고도 하며 1730년께 봉산인 이경남 (李景男)이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북서쪽 1km 불매등 북쪽 금귀산 중턱의 골짜기로 옛날 스님들이 피난가면서 부처를 묻었다고 한 불매골(佛埋谷)이 있다.
고려때 관안산의 갓안골에 있었던 안흥사 절 이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고 함양 오씨와 청주 한씨에 의해 창동되었다고 한다. 마을입구 지방도변에 둔마초등학교는 1953년 개교하여 1994년에 폐교되었다.
아주, 내곡, 상촌, 대곡 4마을이 있다.
고려말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남쪽 2km 떨어진 산속에 큰 방만한 자연굴인 인굴(人窟)이 있으며 옛날 사람들이 피난하였던 굴이라고 알려져 있다.
1850년께 파평 윤씨와 연안 송씨가 아들을 얻기 위해 새터를 잡아 옮겨 온 연유로 "살목 새터"라고도 불린다.
"살목 웃마"라고도 하는데 살목이란 마을앞을 흐르는 양항천의 서쪽이 좁아서 고기잡이 살을 놓기 좋은 여울목이라 하여 생긴 이름으로 시항(矢項), 전촌(箭村이)이라 썼고 조선말까지 고모현면의 면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다. 옛날 창녕 조씨와 함종 어씨가 먼저 살았다고 전해진다.
"살목 큰골"이라고도 하며, 고려말 무과급제를 했던 유형귀 장군의 전설이 있으며 뒷산에 유장군의 묘가 있다. 마을 북동쪽 아주로 가는 산골짜기 중신골에 고려때 창건한 청연사터가 있었는데 300여년 전 심소정 중건 때 뜯어서 옮겼다고 한다.
양곡, 무릉, 월곡, 산포 4마을이 있다.
마을 남서쪽 황강냇가에 큰 바위가 있으며 벼락바위 또는 양석(陽石)이라 하였는데 450여 년 전 큰 바위 그늘을 피하여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은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1530년 신여좌가 양평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뒤쪽으로 성령산이 있으며 정상주위에 옛 성터가 150여 미터가 남아있고 월곡산성터라고도 하며 중턱에 정토사(淨土寺)가 있다.
"무릉동, 무등곡" 및 "무덤실" 등으로 불리는데 삼한시대 이 부근에 陣地가 되어 전사자의 무듬이 마을뒷산에 많아서 불러진 이름이나 마을내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있었다하여 武陵이라 불리워지고도 있다. 옛 무등곡면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1914년 고모현면, 지차리면과 합하여 남하면을 만들때 면사무소를 무릉에 두게 되었으며 현재 소재지 마을이다. 마을의 서쪽을 바라보는 북쪽부분을 "넘마", 남쪽의 남, 서로 향하는 곳을 골담이라 한다. 가야시대 김해 허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전한다.
마을 남쪽 어귀의 청룡날이 반달 같아서 半月山이라 하고 월이곡리(月伊谷里) "달이실"이라 하다가 현재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예종1년(1469년) 화순인 최세식이 살기 시작했고, 임진란 때 영산인 신정걸이 옮겨 왔다고 전해진다. 마을 북동쪽에 일산봉이 있으며 빼재는 잿길로서 지산리로 통한다.
마을뒤에는 山이 앞에는 黃江이 흐르고있어 山을 싸고 川이 흘러 내린다하여 山浦라고 불리워지나 武陵桃源을 찾아 가려면 이 마을에서 묻는다는 뜻에서 "멱실(覓谷)"이라 하였고 18세기 말엽 정조때에 광산김씨와 화순최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면사무소가 무릉(평촌)에 소재하였으나 주민불편으로 멱곡으로 이전하여 10여년간 존속하다가 1930년 무릉마을로 재이전되었다.
대야, 오가, 용동, 가천 4마을이 있다.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대바지"라고도 하며 뒷산이 "잇기야"자 같아서, 또는 냇가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무 야(冶)" 자를 써서 대야(大冶) 또는 대바지의 "바"자를 아(雅)로 써서 대아(大雅)라고도 하였다. 마을 뒤쪽에 감투봉이 자리하며 옛날 원님이 대바지 무우맛에 반하여 사임산을 감투봉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1989년 합천댐 건설로 많은 가구가 정든 고향을 떠났으나 2004년 문화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늘고 있다.
다섯 번은 피난할 수 있는 곳이라 "오가리"라고도 하며 한 도사가 나라안 사람이 사흘 먹을 것이 있다 하였는데 과연 이곳 금광에서 많은 금이 나왔다고 한다. 17세기 중반 효종 때 전라도 창평에서 고세징(高世徵)이 옮겨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1917년께 금광을 열어서 한때 10명의 광주 및 100여명의 광부가 50여호의 가구를 이루어 살았다.
마을뒷산이 "방아공이"설이라 하고, 마을 근처에 방앗간이 있어"방앗재"라고도 하며 진양정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마을 북서쪽 뒷산에 가천에서 대야로 통하는 방앗재가 있다.
가천 냇가 산 기슭 개천이 골짜기의 가장 안쪽에 있으므로"안개천"이라고도 하며 1597년 정유재란때 추사용(秋史庸)이 영월에서 옮겨와 마을이 시작되었다 한다. 마을 북동쪽 가조방향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쇠를 만들던 점터가 있다.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5마을이 있다.
처음에는 북서쪽 산기슭에 살다가 호랑이를 피해서 지금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조그마한 골짜기에 피난하여 숨어 사는 곳이라 "숨을 은(隱)"을 사용 "어은리(漁隱里), 어인골"이라 하던 것을 고종 32년(1896년) 거창부사 홍세영(洪世永)이 자하로 고쳤다. 또한 이조 22대 영조대왕 4년에 거창읍에 거주하였던 居昌劉氏들의 逃避한 곳이라는 뜻에서 隱골이라 불렀고 15세기 중엽 세조때 거창유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지산리에서 가장늦게 생긴 마을로 "새터"라고도 부르며 15세기 전반 중종때 하빈 이씨가 옮겨 왔다고 한다. 지산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가조로 학구가 변경되었다. 화주대골은 마을에서 남서쪽 1 킬로미터 대야와 오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하빈인 이상모, 이최묵 양대가 진사가 되어 선산에 석물을 할때 화주대를 세웠던 곳이라 한다.
동네 터가 밭으로 둘레에 담장이 되어 있어 "담안밭"이라 부르던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으며 줄여서 "담밭"이라고도 하며 1728년 무신란 때 가조 녹동에서 성산 배씨가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남서쪽 300미터 지점에 금천골이 있으며 죽백산에 잇땋아 금이 많이 있다하여 이름하였고 일제 때 5년간 금광업이 성했던 곳이다.
마을 뒤편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 "정곡리(井谷里)"라 하다가 1896년에 홍세영 부사가 천동(샘골)으로 고쳤다고 하며, 15세기 중엽 이침(李沈)이 대구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북동쪽 뒷산에 장군석 날등이 있으며 임진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지세를 살펴보고 인재가 날것을 막기 위해 지도에다 붓으로 맥을 끊으니 이 날등 땅이 패이면서 피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지산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로 한점리(寒店里)라 부르고, "한절골"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절은 옛 관청을 뜻함, 마을뒷산에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
본 군 서부의 남단에 자리하며, 본 면의 동북쪽에 솟은 취우령(驟雨嶺)에서 남쪽 건흥산(乾興山)을 향해 뻗는 산줄기가 동쪽 거창읍과 경계 짓고, 북쪽은 위천면과 맞닿으며, 남서쪽은 기백산(箕白山) 줄기가 함양군 안의면과 군계를 이룬다.
본 면은 조선말까지 위천면, 북상면과 함께 안의군에 따랐다가 1914년에 거창군에 들어왔다. 본 면의 북부는 동리면(東里面)이라하여 장백, 신벌, 영승, 상율, 하율, 월화, 사동, 신기, 지동, 등동(登洞), 주암 11개마을이 있었고,남쪽에는 고창, 구라(仇羅), 엄정, 고학 4개 마을에 남리면(南里面)을 두었는데, 남리면은 신라 경덕왕 16년(757)까지 마리(馬利)라하다가 이안현(利安縣)이 되어서 천령군(天嶺郡)에 따랐다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감음현(感陰縣)에 합쳐져서 안음현, 안의현, 안의군의 남리면이었던 것이 1914년에 동리면과 합하여 마리면이 되어서 거창군에 붙었다. 동리면은 위천, 북상과 함께 가야시대까지는 염례, 남내(稔禮, 南內)라고 하다가 757년에 여선현(餘善縣)이 되어서 거창군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에 감음현에 따랐고, 그 뒤 조선 영조 5년(1729)에서 영조 12년 (1736)까지 거창에 붙여졌던 일 밖에는 1914년까지 안음, 안의현 또는 군이었다. 지금은 영승리, 율리, 월계리, 말흘리, 고학리, 대동리, 하고리 7개 리에 23개 마을이 있다.
본 면의 동쪽으로는 취우령(驟雨嶺)이 거창읍과 경계를 이루며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 아래로 위천천이 나란히 흐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취락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풍광이 매우 수려하다. 영승리에는 영승, 계동, 장백 등 3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승리라는 명칭은 3개 마을중 가장 큰 영승마을에서 비롯 되었다.
본 면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여 위천면 당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舊) 읍지(邑誌)에 의하면 예부터 이곳에는 율도(栗島)가 있었다고 한다. 율리란 명칭도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상율, 풍계, 장풍, 도동으로 나눈다.
마리면 서쪽 기백산의 동북동 능선에 솟은 오두산(烏頭山, 942m)와 영천과의 사이에 동남향의 터전에 자리한다. 월계는 월화(月華)의 월자와 월화, 학동, 토점에서 동쪽으로 영천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가닥의 시내에서 시내계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월화, 영신, 학동, 성락, 토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면의 한가운데 자리하며 고학에서 내려오는 주암천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말흘은 마을과 관청의 옛말 "마을"에서 나왔고, 가야시대 이 근처의 부족을 다스리던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으로 여겨진다. 진산, 지동, 주암, 재음, 창촌, 원말흘, 송림 7마을이 있다.
본 면의 서쪽끝에 솟은 기백산의 동남기슭에 자리하여 남동쪽 함양군 안의면과 경계한다. 가야시대 마리(馬利)에 따랐고, 마리는 머리(頭, 首)의뜻으로 부족장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한다. 8세기 통일신라 때 천령군 이안현(天嶺郡 利安縣)이 되었다가 14세기말 고려 고양왕 때 감음현(感陰縣)에 속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음, 안의현의 남리면 소 재지가 되었다. 높은 언덕 앞에 세 봉우리가 솟아 있고, 개울물은 새 '을'자로 모여 흐른다. (高阜前庭 三峯立 泉水合流乙字溪)라는 글귀모양 첩첩산중에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다. 고학은 높은 언덕이며 풍수설의 산세 모양에서 높을 '고'자, 새 '학'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병항, 고신, 고대, 상촌 4개 마을이 있다.
본 면의 서쪽 끝 기백산에서 바래기(反樂)재까지 뻗은 능선은 그대로 남동진하여 안의면 귀곡리, 초동리와 경계를 이루고, 한 가지는 동북진하여 말흘리로 향하는데 이 두 산줄기의 동남쪽 골짜기와 서쪽 부분이 대동리다. 대동리는 옛 동리면의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5개 마을이 있다.
마리면의 동남단에 솟은 662cm의 망덕산(望德山) 서북 기슭에 자리하며 동쪽은 거창읍 송정리, 남쪽은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와 맞닿인다. 하고는 아래에 있는 소곡과 높은 곳에 있는 고창(高昌)을 아울러서 일컬는 말이다. 고창, 세동, 소곡 3개 마을이 있다.
===============================================================
본 군의 중앙부 북단에 자리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와 맞닿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남쪽에 웅양방 또는 웅양면이라 하여 동변리(東邊里), 신창리(新倉里), 화동리(和洞里), 죽림리(竹林里) 등 5개 리를 두었고, 북서부는 적화현방(赤火 峴坊)또는 적화면(赤火面)이라 하여 아주리(鵝州里), 대현리(大峴里), 취송정리(翠松亭里) 등 3개 리가 있었는데, 지금 은 이곡을 적화, 적하, 하성(赤火, 赤霞, 霞城) 등으로 부른다. 1914년 2개 면을 합하여 웅양면이라 한다. 본 면의 남쪽 주상면 성기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 곰이 누워있는 모양 같 아 와웅산(臥熊山) 또는 곰내뫼, 웅남(熊南)이라고도 썼다가 양지바른 따뜻한 곳이라 하여 웅양이라 한다. 지금은 동호 리, 죽림리, 노현리, 산포리, 군암리, 신촌리, 한기리 등 7개 리로 나눈다.
동호와 성북으로 나눈다.
운평, 구암, 유령, 죽림 등 4개 마을이 있다.
노현, 원촌, 화동 세 마을로 이루어졌다.
산포, 석정, 우랑, 강천, 금광, 어인 여섯 마을이 있다.
용전, 구수, 군암, 송산 네 마을이 있다.
아주, 신촌, 왕암, 진마루 네 마을이 있다.
원오산, 신오산, 백학동, 하곡, 한기 다섯 마을이 있다.
==========================================================
거창군 - 순서:
1 거창읍 2 가북면 3 신원면 4 남상면 5 위천면 6 고제면
7 주상면 8 가조면 9 남하면 10 마리면 11 북상면 12 웅양면
거창읍(居昌邑)
거창읍은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창군, 거창현, 거창부의 치소(治所)가 있어온 본 군의 행정, 교육, 교통, 경제의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관청, 학교, 기관단체들이 모여 있다.- 동부면(東部面) : 조선 말기까지는 영천(瀯川) 북동 언저리를 동부면이라 하고, 죽전리(竹田里), 노혜리(老惠里), 강양리 (江陽里), 양무당리(養武堂里), 교항리(橋項里) 등 5개 리가 있었다.
- 천내면(川內面) : 동부면의 서쪽에 천내면을 두었는데 상림리(桑林里), 토랑리(吐郞里), 상천내리(上川內里) 등 3개 리가 있었다.
- 천외면(川外面) : 거창읍의 영천 남쪽에 따로 천외면을 두고 절부리(節婦里), 중리(中里), 장팔리(章八里), 하리(下里), 웅곡리(熊谷里), 정장리(正莊里) 등 6개 리로 나뉘었다.
- 거창면·읍(居昌面·邑) : 1914년 동부면(東部面), 천내면(川內面), 천외면(川外面)을 합쳐서 읍내면(邑內面)이라 하다가 1937년 1월 15일에 거창면이라 고쳤으며 1937년 7월 1일에 거창읍이 되었다.
- 모곡면(毛谷面) : 아월천(阿月川) 서쪽 북서부 일대에 모곡면을 두어 용원리(龍源里), 모곡리(毛谷里) 등 2개 리가 있었다.
- 음석면(陰石面) : 아월천(阿月川) 동편 금귀산(金貴山)의 서쪽 기슭인 북동부 일대에 음석면을 두어 사지리(沙旨里), 당림동리(堂林洞里), 원학동리(猿鶴洞里)의 3개리로 나뉘었다.
- 가을지면(加乙旨面) : 거창읍의 중서부 일대에 가을지면을 두고 향교동리(鄕校洞里), 개화리(開花里), 묵곡리(墨谷里), 가사리(加士里) 등 4개 리로 나뉘었다.
- 읍외면(邑外面) : 1914년에 모곡, 음석, 갈지 등 3개 면을 합하여 읍외면이라 하고 서변리(西邊里), 동변리(東邊里), 학리(鶴里), 양평리(陽坪里), 가지리(加旨里) 등 5개 리로 나누었다.
- 월천면(月川面) : 1937년 1월 15일 면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아월천(阿月川) 이름을 따서 월천면이라 하다가 1957년 10월 29일에 거창읍으로 합해졌다. 거창읍 중앙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영천(瀯川) 냇물을 사이에 두고, 상림리, 중앙리, 내동리 일대를 내안 혹은 "물안" 천내(川內)라고 하며, 영천 냇물의 남쪽 일대 송정리, 김천리, 장팔리, 대평리, 정장리를 통털어서 내밖 천외(川外) "물밖"이라고 한다.
거창읍은 상림리·중앙리·대동리·김천리·대평리·정장리·장팔리·송정리·서변리·동변리·학리·양평리·가지리 등 13개 리 37개 마을로 나누어져 있다.상림리(上林里)
1914년부터 천내(川內) 제 1 교 서북부를 상동(上洞)이라 하였는데 1988년 8월 1일 상림리로 개칭, 상동(上洞)과 원상동(元上洞)으로 나누며, 옛날은 천내방(川內坊)에 딸았다.상동(上洞)
거창군의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으며 거창군청, 거창군의회, 거창읍사무소, 거창경찰서,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KT거창지점, 한국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거창적십자병원, 아림초등학교, 거창혜성여자중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숲골 : 전신전화국 서쪽 부근으로 침류정(枕流亭) 위의 마을을 말하며 쑥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상림리(桑林리)라 기록했다.
- 시무정골목 : 침류정에서 경찰서로 가는 길을 침류정골목이라고 하였다.
- 탑산골목 : 영천변에서 우체국으로 통하는 탑이 있었던 골목을 말한다. 쌍사자석등(石燈)의 부품인 듯한 석재와 탑석을모아놓고 동제를 지내오다가, 1988년 거창박물관으로 옮겼다.
- 시비당 : 우체국 북쪽 뒤편 세무서와 적십자병원 일대를 말한다. 일제 초기에 수비대가 있었던 곳이다.
- 또랑말 : 옛날의 토랑리(吐郞里)로 석조관음입상이 있는 미륵댕이 남동쪽 도랑 옆 옛날 유씨(劉氏)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정장리(正莊里)로 옮겼다고 한다.
- 광터 : 지금의 혜성여자중학교 앞을 광터밭이라고 하였다. 옛날 아림사에 따른 9개의 암자가 있어 9암터라 이름하였다.
- 앞담뒤 : 군청 북쪽 뒤의 마을을 말하여 옛날 객사의 높은 담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앞담의 뒤라는 뜻에서 이름되었다.
- 공수(公須)들 : 거창읍의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이 들판 전답은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 한다.
- 아림사리(娥林寺址) : 상림리와 중앙리 일부에 아림이라는 큰 숲이 있었는데 한가운데에 아림사가 있었다. 고려 우왕 6년(1380)에 침입한 왜구(洪武亂)에 의하여 소실되었으나 "아림"은 오늘까지 거창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거창초등학교, 군청,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적십자병원 등이 있는 곳이다.
원상동(元上洞)
옛날 천내방으로 내안 또는 웃내안으로 부르고 있다. 북서쪽 500여 미터 지점에는 원상동에 부속된 미륵댕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중앙리(中央里)
거창읍의 중심지로서 하동(下洞)이라 하다가 1988년 8월부터 중앙리라 하였다. 하동(下洞)과 죽전(竹田) 두 마을로 이루어졌다.하동(下洞)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내 제1교와 아림로(娥林路)의 동쪽을 하동이라 하였으며 거창의 중심지이다. 거창초등학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관과 거창군농업협동조합, 국민은행, 경남은행, 거창상설 시장, 거창기독교회 등이 자리하고 있다.- 뒤삼박골 : 현시장 일대를 말한다. 옛날에는 삼밭이 많았다고 한다.
- 당산걸 : 시장 서쪽 농업협동조합 앞의 남쪽방향 골목으로 몇 년 전까지도 큰 고목이 있었고 거기에서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 물측거리 : 하동 냇가 길거리를 말한다.
- 뒷들 : 거창초등학교 뒤 북쪽 주택지를 말하며 옛날 이 곳은 논들이었다.
- 죽전(竹田) 대밭밑 : 뒷산 줄기가 대나무 마디처럼 생겼고 대밭이 있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풍수설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형국이라하여 계산(鷄山)이라 하였다. 마을 북녘을 막아주는 언덕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샛별초등학교 샛별중학교, 거창여자중학교,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 석식들 : 죽전과 개봉 사이의 들
- 골닭원 : 현 법원 남쪽 골짜기
- 닭원만당 : 현 충혼탑 일대, 옛날 이곳 당산나무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
- 삼화사(三和舍) : 마을 한가운데 남향의 집이 있었는데, 옛날 선비들이 모여서 글 재주를 겨루던 곳으로 지금의 검찰지청관사 자리다.
대동리(大東里)
거창읍 천내 가장 동쪽에 있고 옛날 동부방(東部坊)에 따랐으므로 동동(東洞)이라 하였다가 1988년 8월 1일 대동리로 고쳤으며, 동동(東洞), 강양(江陽), 개봉(開封), 동산(東山) 4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동동(東洞) 동부
동부방(東部坊)이 있던 곳이므로 일명 동부(東阜)라고도 한다.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가 있다.- 밤숲 : 거창중학교 터에 있던 솔숲을 말하며 이곳은 아월천(阿月川)과 영천(瀯川)이 아우르는 곳이라 항상 수해가 심하여 방수림으로 심었으므로 방숲이 와전되 밤숲이라 전하고 있다. 옛날에는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터에 거창공설운동장이 있었고 근처에 과수원이 있었다.
강양(江陽) 개양
영천(瀯川) 강가의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江陽, 溪陽) 개양이라 부른다.- 비선거리 : 마을 동쪽 길가에 김인순(金麟淳)부사의 불망비와 역대 수령들의 선정비와 김현석(金玄錫)현감의 비 등 많은 비가 서 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개봉(開封) 묵실
가야고분이 마을 뒷산에 있으므로 뫼가 있는 골짝이라 하여 뫼실로 부르다가 묵실로 바뀌어졌는데 개봉은 뫼를 처음 썼다는 뜻이기도 하다. 거창 신씨의 옛 중국 고향 지명 개봉부(開封府)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며 옛날은 가을지방의 묵곡리(加乙旨坊 墨谷里)라 하였다.- 소만들 : 마을 북동쪽 모래둑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대까지의 논들을 말하며, 여기 따른 보(洑)를 소마이보라 한다.
- 양혜원(養惠園) : 마을 북쪽으로 700여미터 들어가 국도 서쪽에 1950년대에 새로생긴 마을이다.
- 못안골 : 마을 북쪽 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야산 골짜기로서 옛날 골짜기 어귀에 못이 있어서 이름되었다.
- 아래못안골 : 양혜원의 서쪽 어귀에 있는 골짜기로 못안골의 아랫 골짜기다.
김천리(金川里) 쇠비내
웅고에서 내려오는 개울 물에 녹물이 내려 오므로 쇠빛내 또는 쇠비내 김천동(金川洞)이라 하였고, 또 옛날 소옹(蘇翁) 같은 사람이 살았으므로 내 이름을 소부천(蘇父川)이라 하였던 것이 소붓내 쇠붓내 쇠비내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냇물의 서쪽을 웃쇠비내 동쪽을 아랫쇠비내라고 한다.대평리(大坪里)
옛날 천외방 중리라 하였고 중동이라 하다가 1988년 8월부터 대평리라 한다. 거창읍의 동남녘 한들에 자리하므로 대평리라 하고 중동과 들성(坪城)으로 나뉜다.중동(中洞), 아래내박
마을 가운데 동서로 가로 지르는 도로 남쪽을 앞담이라고도 한다. 창남초등학교, 거창소방서, 시외버스합동주차장, 한국전력거창지점, 천주교회 등이 자리한다.- 신(申)문골목 : 중동마을 한복판 골목을 신씨가 잘 살았다하여 신문골목이라 하였다.
- 밭들 : 지금의 버스합동주차장 끝에 있는 마을로 옛날 밭이 많아서 이름되었다.
- 뒷내 : 지금의 중동마을 북쪽 뒤편에 있는 가래울 용수로와 영천사이의 마을이다.
- 한들 : 중동의 동쪽에 있는 논들을 말하며 300여 정으로 거창군에서는 가장 넓은 들이다.
들성(坪城)
서기 645년 김유신장군이 백제군 2천명을 섬멸했던 신라성 매리포성(賣利浦城)으로 추측하고 있다. 왜란 때 명나라 장수 유정·이령·조승훈·갈봉하(劉綎·李寧·祖承訓·葛逢夏) 등이 한때 머물었던 곳이라 한다.- 가래울들 : 한들 동편의 논들을 말하며 추평(湫坪)이라고 한다.
송정리(松亭里)
"웃내밖(上川外)"이라고 부르고 있다. 송정, 운정, 절부(松亭, 雲亭, 節婦) 3마을이 있다.송정(松亭) 솔지이, 솔뚜백이
옛날에 반송(盤松)이 있어서 솔뚜백이 또는 솔지이라 하였다.운정(雲亭) 구름지이
마을 북쪽의 앞들은 구릉논(低濕畓)이 많아서 구릉지이가 구름지이로 바뀌었다.- 절터골 : 마을 서남쪽 골짜기로 옛날 절터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이름되었으며, 절터골이라고도 한다.
- 긴날등 : 망덕산 주봉에서 동으로 뻗은 산줄기를 말한다. 망덕산 모양이 서쪽을 향해 나는 닭 같고 이 줄기는 닭의 등 같다 붙인 이름이다. 능선에 초동길이 있다. 일병 비계장등(飛鷄長嶝) 또는 비계날등이라고 한다.
- 마동(馬洞) : 운정마을 남동쪽으로 200여 미터지점에 있는 마을로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기고 말의 뒷꿈치 형태에 자리하였다고 일명 마적동(馬蹢洞)이라고도 한다.
- 마적(馬蹢)들 : 마을 남서쪽 뒤편 일대의 야산 평원을 말한다.
절부리(節婦里) 제불
고려 홍무란(洪武亂) 때 왜적에게 절개를 지켜 순절한 탐진 최씨(耽津 崔氏)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을 절부리라 하였는데, 달리 제불이라고도 한다. 마을 어귀에 절부지리(節婦之里)라는 비가 있다. 일정 때 정려를 없애고 덕곡(德谷)으로 고쳤다가 광복후에 되찾았다.장팔리(長八里)
장팔리와 송정리 사이에 바위 8개가 있는데 그 정기를 타고 8장사나 8문장이 난다 하여 장팔리(將八里) 또는 장팔리(長髮里)라고 기록된 일도 있다. 장팔(章八)·중산(中山)·웅곡(熊谷) 등 3개 자연마을을 이루고 있다.장팔(長八)
동사무소가 있는 가운뎃담을 기준으로 북쪽 300여 미터 되는 곳에 아랫담과 남쪽 500여 미터 되는 곳에 웃담 남서쪽 1.5 킬로미터 쯤에 웃장팔(골장팔리)의 4개 마을이 있다.중산(中山) 중뫼
옛날부터 중뫼라 하고 근래"중사이"라고도 부른다.웅곡(熊谷) 곰실
마을 뒷산에 웅장(熊掌)설이라는 명당자리가 있어서 곰실이라고 한다. 조선 세조(世祖)때 영천이씨가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었다. 1965년 3월 11일 분 불이 나서 47채의 집이 타버렸으나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굴골 : 마을에서 북서쪽 골짜기로서 절터가 있고 굴이 있다.
- 서당골 : 마을 남쪽에 있으며 큰 서당, 작은 서당터가 있어 이름되었다.
정장리(正莊里)
조선초에 장원(莊園)을 두고 농소(農所)를 설치하여 나라에서 관리함으로서 생긴 이름이라하며 정장(正莊) 국농소(國農所) 2개 마을로 나누어져 있다.정장, 정쟁이
동사무소가 있는 정장마을과 남쪽 500여 미터에 소래실, 서쪽 800여 미터에 상살미 등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소래실(率禮谷) : 마을 앞에 소라설이라는 묘가 있어 이름되었다고 한다.
국농소(國農所)
조선 성종대왕(成宗大王)이 제 4자 완원군(完原君)의 5대손 승의랑 이유길(承義郞 李惟吉)이 은거한 곳이다. 그의 아버지 대사헌 위(大司憲 瑋)가 1592년 임란 때 전사하고 그 후손이 살게 되었으므로 나라에서 낙향귀농(落鄕歸農) 한 곳이라고 하여 국농소라 이름 지었다. 달리 "국노실"이라고도 한다.서변리(西邊里)
원서변 마을과 원동변 마을 사이의 냇물인 모곡천(毛谷川)은 본시 원동변 마을서쪽 끝에서 남동쪽 사지마을을 거쳐 양평마을 앞에서 아월천에 합류해다. 이 모곡천이 범람하면 수해가 심하므로 직강공사를 하여 지금과 같이 동쪽으로 바로 흐르게 하였다고 하며, 옛날에는 모곡천의 동쪽에 원동변 마을이, 서쪽에는 원서변 마을이 자리했으므로 동변리·서변리로 나누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강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하여 그 상류를 북으로 삼아서 동, 서를 나누었다고도 한다. 원서변(元西邊), 사지(沙旨), 사동(沙洞), 원동(院洞) 등 4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모찔·모곡(毛谷)
서변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월천초등학교, 거창농협월천지점 등이 있고, 옛 읍외면과 월천면사무소 소재지였다. 근래 원서변 마을도 "모곡"·"모찔"로 부르고 있다. 약 500년 전에 남하면 지산에서 해주 오씨가 옮겨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서남쪽 낮은 산 사이에 영산(靈山)골·흰비선골·집골·샛골·밭골·장삿골·자지능골 같은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사이를 넘나드는 막재·달성고개 같은 잿길이 있다. 마을의 서쪽에 애머리밭들 서남쪽에 대한(大旱)들 남쪽으로는 부치기들이 있고 동쪽에는 번답들 동남에는 굴평들·검은들이 있다.사동(沙洞) 사기막골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서 "사기막골"이라 하였다. 1800년께 선산 김치구(善山 金致九)가 모곡(원동변마을)에서 옮겨살게 되었고, 밀양 변씨도 가지리에서 함께 옮겨 오게 되어 두 성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한말 모곡방사촌(沙村)이었고, 1914년 읍외면 동변리(東邊里)에 속했다가 1937년 월천면 서변리에 따르게 되었다.사마, 사마리
옛날 사마(司馬) 벼슬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하여 사마리라 한다. 한말까지 음석방(陰石坊)에 속했으며 1914년 서변리(西邊里)에 속하게 되었다.- 새보들 : 마을 서쪽의 논들을 말한다.
- 찬물내기들 : 마을 남쪽에 있는 논들이다. 땅이 낮아서 찬물이 많이 생겨서 이름되었다.
- 아월천(阿月川) : 마을 동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내이다. 이 내는 사방이 트여 달빛을 잘 받아 땅거위가 노는 것을 밤에도 볼 수 있어 아월천(鵝月川), 아드내라고도 하며"아달내""아드내" 라고도 부른다.
원동(院洞) 서원마
조선 숙종(朝鮮 肅宗)때 (1675 ~ 1720) 세운 용원서원(龍源書院)이 있었던 곳이므로 서원마라 불리며 모곡방 용원서원리(毛谷坊 龍源書院里)였던 곳이다. 마을 뒤의 산세가 나팔 같고, 나팔의 앞을 막으면 아니된다 하여 집집마다 사립문을 달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동변리(東邊里)
건흥산에서 내려와 원동변과 원서변 두 마을 사이를 남동남으로 사지마을을 향해 흘러서 양평 앞에서 아월천에 합류하던 모곡천(毛谷川)의 동쪽에 자리하므로 동변리라 했다. 원동변·죽동(竹洞)·구산(九山)등 3개 마을로 이루어 졌다.모곡(茅谷), 큰마
동변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큰마라고 한다. 한말 모곡방 때와 일정초기 읍외면 때 면 소재지 마을이었다. 본시 이 마을을 모곡(茅谷) 모찔이라 불렀다.죽동(竹洞) 죽마
마을에 대나무 숲이 있다하여 이름되었고 서쪽으로 300여 미터 쯤에 담안 이란 마을이 있다. 마을 주위에 돌담이 많아 이름되었다.- 취우령(驟雨嶺) : 마을 북서쪽으로 마리(馬利)와 경계하고 있는 높이 795미터의 산이다. 멀쩡한 날씨에도 소나기가 잦아 소나기취, 비우, 취우령으로 이름지었다.
- 부처개울 : 취우령 일대로부터 담안 마을 서쪽을 흐르는 내를 말한다. 근처에 부처를 모신 암자가 있어서 이름되었다.모곡천(毛谷川)에 들어간다.
구산(九山) 독죽골
마을 700여 미터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을 따라 구산(龜山)이라 부르다가 곁에 있는 아홉골(九曲·九山)에 연유하여 구산이라 한다.- 구산(龜山) : 마을 남쪽에 있다. 거북이가 앉아있는 형태라 이름되었다. 거창 신씨(愼氏) 종산이며 우리나라 8명산 중 하나라고 하여, 잘 다듬어진 신씨들의 많은 묘와 묘비가 있다.
학리(鶴里)
조선 때는 음석방(陰石坊)에 속했으며 학동, 의동, 구례 (鶴洞, 薏洞, 九禮) 등 3개 마을을 이루고 있다.학동(학동) 원학골
고제에서 내려오는 완계(浣溪)와 웅양에서 내려오는 미수(渼水) 두 물이 어울리고 그 사이에 세 산이 있어서 ‘三山二水’ 신선이 사는 경치 좋은 곳이라하여 원학동(猿鶴洞) 원학골이라 한다. 400여년 전에 청주한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내학·외학·장성골 등 세 마을이 있다.- 내학(內鶴) : 마을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하여 안원학골이라 한다.
- 외학(外鶴) : 마을이 안원학골 밖에 있으므로 바깥원학골 또는 새마라고도 한다.
- 장승골(長城洞) : 내학마을에서 남쪽으로 600여 미터에 있으며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승골이라고도 한다.
- 유가밭골 : 내학마을 북동쪽으로 400여 미터의 산골이다. 옛날 문화 류씨(文化 柳氏)가 살았던 곳이다.
- 굴밭골 : 내학마을에서 동쪽으로 500여 미터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이 곳에 길이 5미터 가량의 굴이 있는데 곰이 살았다고 한다.
- 사기(沙器)막골 : 내학마을에서 동쪽으로 500여미터의 산골짜기이다. 이곳에는 조선 중엽에 사기를 만들던 곳이라고 하며, 지금도 깨어진 사기조각이 많이 발견된다.
구례(九禮)
마을 뒷산의 정기로 9정승이 날 곳이라는 풍수설에 따라서 이름지었다 한다. 골구례·밑담·점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골구례 : 원래는 원구례(元九禮)라 한 것이 구례 남쪽 어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지금은 골구례라고 한다.
- 밑담 : 논들 가운데 있으며 마을의 서쪽 밑에 있다 하여 이름되었고 여흥민씨(驪興 閔氏)들이 많이 살고 있어 민담이 라고도 한다.
- 점담 : 최근까지 옹기를 굽던 곳이라 옹기점에 연유하여 이름되었다.
- 법치이(法川)골 : 마을에서 北東쪽 2킬로미터 지점의 금귀산 서편 기슭의 넓은 골짜기 법천서(法川寺)가 있었다 하며, 지금도 기와 조각과 축대 등의 흔적이 있다. 흐르는 개울도 법천(法天)이라 부른다.
의동(意洞) 여의골
원래는 지금 마을의 북동쪽 1킬로미터 위에 있었으나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선산 김우봉(善山 金羽鳳)이 영조 때인 1770년게 지금 자리로 옮겼다. 남서남으로 트인 말발굽모양의 작은 분지로서, 마을 어귀 남쪽은 뱀의 머리 모양이고 북쪽에는 자라목 모양의 날이 10여칸을 사이에 두고 맞대어 마을을 드나드는 길목을 이룬 구사합문(龜蛇合門)의 명당 자리라 한다.양평리(陽坪里)
조선시대에는 음석방(陰石坊)이였으며 양평, 당동, 노혜, 김용(陽坪, 堂洞, 老惠, 金龍) 등 4개 마을이 있다.양평, 가네들
마을 앞에 큰 돌이 서 있어서 돌 그늘이 마을까지 이르렀는데 그 돌을 음석(陰石)이라 하고 지명도 음석방이라 하였다. 음석 그늘돌이라는 것이 거널들·가너들로 변하여 세평(細坪)이라고도 썼다. 세종조에 거창 신씨의 선조 신언(愼言)이 개화리에서 옮겨옴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조선 중기에 음석을 없애고 '그늘음'자가 좋지않다하여 '볕양(陽)'자로, '돌석(石)'자를 '들평(坪)'자로 바뀌어서 양평이라 하였고, 조선말까지 음석면(陰石面)의 소재지였다.- 강선골(降仙洞) : 마을 북동쪽 100여 미터로 신언(愼言)이 조상의 신주를 모시던 곳이다.
- 문릉골(陳畓谷) : 마을 동쪽으로 1.2킬로미터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달박골(月明谷) : 마을 1킬로미터 정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사방이 잘 트여 달이 잘 보인다.
당동(堂洞), 땅골, 봉우땅골
마을 북동쪽으로 높이 872미터의 금귀봉이 있는데 옛날 봉화산으로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어서 땅골 또는 봉우땅골로 불리며 아랫땅골(下堂洞) 웃땅골(上堂洞)등 2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약 400여년 전 중종 때에 창녕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장군(將軍)골 : 웃땅골 북쪽에 있으며 옛날의 토기굴 흔적이 있다.
- 삼막(三幕)골 : 웃땅골 북동에 있으며 세 갈래로 되어 있는 산골이다.
노혜(老惠), 홈거리
조선시대에는 동부방 노혜리(東部坊 老惠里)였다. 마을 가운데 누에 모양으로 생긴 낮은 산이 길게 뻗어 나와 누에들 또는 뉘들이라 하고, 큰 길을 가로 질러 논밭에 물을 대는 큰 홈통이 있었으므로 홈거리라 하고 노혜사(老惠寺)가 있었다고도 한다.- 갈매재 : 마을 동쪽으로 남하면과 경계점인 도로 위에 있다. 재의 생김새가 소의 갈매(질마)같아서 이름되었다. 풍수설에 갈마음수설(渴馬飮水說)이라 하여 갈마재라고도 한다.
김용(金龍)
옛날 마을 앞 황강 냇물에서 사금이 나왔고 용이 놀았다는 용소(龍沼)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조선 숙종 때 경주 최씨가 마을을 세웠다고 한다.- 성재(城峴) : 마을 북서쪽으로 100여 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재다. 옛날 성터가 있어서 이름되었다 한다.
- 수양골(水陽谷) : 마을 북쪽으로 마을과 붙어 있는 골짜기다. 물과 햇빛이 가득하다고 이름되었다.
가지리(加旨里), 갈마리
뒷산이 칡덩쿨 같이 생겼다 하여 "갈(葛)마을", 일설에는 거열성에서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싸움터에서 달리던 말이 목이 말라 죽은 곳이라 하여 "갈마리(渴馬里)"가 되었다고도 한다. 고려 충열왕(忠烈王 1270~1300) 때 동정 신원간(同正 愼元幹)이 개성으로부터 외가인 유씨(劉氏)를 찾아와 갈지에서 개척하였다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갈지방(加乙旨坊)이었고 개화, 중촌, 갈지, 교촌(開花, 中村, 葛旨, 校村) 등 4개 마을이었다.개화(開花), 개화리
칡의 가지가 지내마을에서 생겨 이 곳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이름되었다. 500여년 전 문화 유씨(文化 柳氏)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마을 북녘에는 비석골, 북서쪽에는 거리골, 버섯나무골, 생이동골이 있다.중촌(中村)
가지리(加旨里) 4개 마을에서 가운데 자리하였다고 하여 이름되었다.갈지(葛旨), 웃갈마리
칡덩쿨의 뿌리에 속한다 하여 이름되었고 웃갈마리라고도 한다. 500여년 전에 만호벼슬을 지낸 인동장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교촌(校村), 향교
마을에 향교가 있다고 교촌이라 하며 조선시대에는 향교동리(鄕校洞里)라고 하였다. 흔히 향교라고 한다. 지금은 거창중앙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오리골 : 대성학교 북서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교촌에 따른 마을이다. 오리가 구릉논에 많이 놀았다 하여 이름되었으며 오류동(五柳洞)이라고도 한다.
============================================================
가북면
우혜리(牛惠)
우혜, 백학, 상감월, 중감월, 하감월, 은사동, 어인의 7개 마을이 있다.
- 우혜(牛惠) : 농부가 어린 것을 논두렁에 눞혀두고 일을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헤치려 하자 소가 호랑이와 싸워서 상하는 틈에 어린 것이 살았으므로 소의 은혜를 생각하여 우혜라고 이름 지었다는 말이 있다.
- 백학(白鶴) : 해발 700m의 높은 곳으로 개간한 땅에 참깨 농사를 많이 했으므로 깨밭골 이라 하였고, 마을 양쪽에 들이 있고, 가운데 산이 솟아 학이 나래를 편 모양이라 하여 백학이라 한다.
- 상감월(上甘月) : 1623년의 인조반정으로 내암 정인홍이 실각하여 처형되자 그의 친척들이 숨어 들어와 살면서 대를 모아 나무를 심고 감음대(甘陰台)라 한 것이 감월(甘月)이라 되었다고 한다. 또 마을 아래 감은사(甘隱寺)절이 있어서 감은리, 감월 리가 되었다고도 한다. 감월에서 가장 위쪽에 있어서 상감월이라 한다.
- 중감월(中甘月) : 350여년 전 마을에 감은사가 있었다 한다. 창밖 숲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아름다워서 감월(甘月)이라 했다고 한다.
- 하감월(下甘月) : 감월에서는 가장 늦게 생겼으므로 새터라 하다가 맨 아래 있으므로 아래 감월리라 한다.
- 은사동(隱士洞)) : 옛날 어진 선비가 숨어 살았다 하여 이름되었고, 300여년 전 금구 이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어인(於仁) : 옛날에는 마을 앞까지 고기가 놀았다 하여 고기어, 어질인 어인(魚仁)이라던 것을 에어(於)자로 바꾸었다.
박암리(朴岩里)
공수, 박암, 호암, 옥산, 신기의 5마을이 있다.
- 공수(孔洙) : 중국 사기에 孔子設敎洙泗之上 "공자가 수수(洙水)와 사수(泗水)가에서 가르쳤다." 라는 글에서 인용한 이름으로, 유학의 마을 또는 선비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앞 냇가 바위가 물에 씻끼어 구멍이 뚫였으므로 공수라한다는 말도 있다.
- 박암(朴岩) : 마을 앞에 있는 박같이 생긴 바위로 하여 마을 이름이 생겼다.
- 호암(虎岩) : 마을 가운데 옛날 호랑이가 누었다는 높이 4m, 길이 7m의 큰 바위가 있어서 "범바위"라고 한다.
- 옥산(玉山) : 마을 곁의 산골짜기에 선녀인 옥녀가 누웠던 자리가 있다하여 "눌목"이라고 하며 옥산이라고도 한다.
- 새터(新基) : 150여년 전 박암 마을에서 안동 권씨가 제금 나와서 이루어진 마을로서 "새터"라 한다.
몽석리(夢石里)
몽석, 덕동, 내촌, 강계, 명동 등 5개 마을이 있다.
- 몽석(夢石) : 임진왜란 때 영동에서 피난온 김영인 김이련(金以璉)이 반석 위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결이 도승이 나타나 이곳이 자손을 키우며 살만한 곳이라 하므로 살기 시작하고 마을 이름을 몽석이라 했다.
- 덕동(德洞) : 후백제 견휜왕의 후손이 이곳에 숨어 살면서 귀한 아들을 얻었다 하여 덕골 이라 했다고 전한다.
- 내촌(內村) : 소학(小學) 내칙편(內則篇)의 예의범절을 배우는 것이 사람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 강계(江界) : 본시 생강장, 터기, "강기(薑基)"였는데 강계로 바뀌였다.
- 명동(椧洞) : 마을 아래 논들로 물을 대는 홈통이 있어서 홈통명(椧)자 명동, "홈거리"라고 불리고 있으며 400여년전 전주 최씨가 최초로 거주한 곳이다.
용암리(龍岩里)
송정, 홍감, 용암, 상개금, 하개금, 장전 등 6개 마을이 있다.
- 송정(松亭) : 처음 마을 터를 잡을 때 온 누리가 눈에 덮혔으나 이곳마은 솔숲에 가리어 눈이 없기에 터를 잡았다 한다. "소지이"라고 한다.
- 홍감(弘甘) : 마을 앞에 가마솥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어서 "홍가마"라고 부르던 것이 홍감으로 바뀌었다.
- 용암(龍岩) : 마을 뒷산에 용의 머리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 상개금(上開金) : 큰골의 가장 북쪽끝에 있는 마을이다. 북동 2km에 경상북도 성주군과 맞닿아 있다. 옛날에는 앞뒤 산과 골짜기에서 금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금광 흔적이 남아있다. 금동 불상이 나왔으므로 "개금불(開金佛)"이라고 하였다는 말도 있다.
- 하개금(下開金) : 개금골의 아래에 자리함으로 아래 개금불이라 한다.
- 진밭(長田) : 마을 앞에서 마을 뒤까지 이어진 긴 밭이 있어서 "진밭"이라 한다.
중촌리(中村里)
불석동, 수재동, 심방소, 다전, 동촌, 산수동, 고비 등 7마을이 있다.
- 불석동(佛石洞) : 가북면 작은골의 가장 북쪽끝 동리였는데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폭시기"라고 하였다. 수도사 부처를 다듬은 돌이 이 골짜기에서 나왔으므로 불석동이라 하였다.
- 수재골(秀材洞) :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이름하여 "수잿골"이라 한다.
- 심방소(尋芳所) : 고려말 신방(申肪)이라는 사람이 은거하던 곳이라 이름되였다. 뒷산에 땔 나무가 많아 신방(新方), 경치가 좋아서 심방 (尋芳)이라 쓰기도 했다.
- 다바지(茶田) : 다바지라 하며, 한말 면우 곽종석(俛宇 郭鍾錫) 선생이 만년에 이곳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하였으므로 전국에서 많은 인사들이 출입하였다. 중촌(中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다가 1995년부터 다전이라 한다.
- 동촌(東村) : 다전 마을의 동쪽에 있어서 동촌이라 한다.
- 산수마(山水洞) : 산수 경치가 좋아서 "산수마"라 한다.
- 고비(高飛) : 해발 700m의 높은 곳에 자리한다. 학이 높이 날면서 놀았다 하여 이름 되었다 하고, 고사리와 같은 고비 나물이 많이 나므로 고비라 한다는 말도 있다.
해평리(海坪里)
회남, 추동, 연곡, 월전, 양암 등 5마을이 있다.
- 회남(淮南) : 희너미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널무이, 판문동(板門洞)" 이라 했다.
- 추동(秋洞) :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나무추(楸)자 추동이라 하다가 가래나무가 없어진 뒤에 가을 춧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뒷산의 큰 바위에 독수리가 살았으므로 '수리더미'라고 하며 수리란 고구려말 봉우리의 뜻이 있다.
- 연곡(燕谷) : 마을 뒷산에 제비 모양이라 "제비실"이라 부르며 200여년 전에 송씨에 의해 마을이 열렸다고 한다.
- 월전(月田) : 마을 뒷산이 닭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 닭밭이라 하다가, 앞들이 둥근 달과 같이 생겼다하여 "달밭"이라 한다. 달전(達田)이라고도 썼다.
- 양암(陽岩) : 마을 앞 길가에 가로 12m, 세로 7m의 큰바위가 있다. 양씨가 이바위에서 놀았다하여 양성암(梁姓岩)이라 하고, 마을을 양성암리(陽城巖里)로 하였는데 양씨가 떠나고, 전씨, 김씨가 살면서 양암으로 바뀌었다.
용산리(龍山里)
용산, 율리 두 마을로 이루어졌다.
- 용산(龍山) : 용산과 정봉 두 담으로 이루어 졌는데, 용산은 가야산에서 마을 뒤까지 남서로 뻗은 산줄기가 용같아서 용산이라 했다는 말도 있고, 옛날 중국의 맹가(孟嘉)라는 사람이 9월 9일 낙모대(落帽台)에서 술 마시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 용산인데, 마을 근처에 낙모대가 있어서 용산이라 한다는 말도 있다.
- 율리(栗里) : 옛날 마을 앞 냇물에 배를 맺던 곳이라 "배속골"이라 했다. 마을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서 율리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4~5세기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이 살았던 땅 이름이 율리 였는데 혹 지조높은 문장이 살았음인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
남상면(南上面)
본면은 거창읍의 남쪽에 맞닿아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북서부에 청림방(靑林坊)이라 하여 한산리, 지하동리, 송변리, 청렴리 등 4개 리가 있었다. 남서부에 고천방(古川坊)이라 하여 무촌역리, 매산리, 동령리, 진목정리 등 4개 리가 있었으며, 남동부에는 남흥방(南興坊)을 두어 남흥리, 율정리, 사불랑리(沙佛郞里), 북죽리, 남불리 등 5개 리로 나뉘었던 것이 지금은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전척리, 임불리, 진목리, 춘전리 등 10개 리로 이루어졌다.
둔동리(屯洞里)
남진, 동령, 신기, 원둔동 등 4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둔동리는 원둔동 마을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 남진(南眞) : 마을 가에 참나무가 많아서 "진목지"라고 하다가 1973년 7월 함양군 안의면에서 진목리가 본면으로 들어온 뒤로 진목의 남쪽에 자리하므로 남진이라 한다.
- 동령(東嶺) : 마을 뒤의 관술령 줄기가 남쪽으로 달리다가 이곳에서 동쪽으로 뻗는 곳에 마을이 자리하므로 이름 되었고 동용골(東龍谷)이라고도 하며 200여년전에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 신기(新基) : 100여년전 둔동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 밭들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새터라고 한다.
- 원둔동(元屯洞) : 마을 뒷산에 옥등잔에 불을 켜서 걸어 놓은 설의 명당자리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마을이 등불에 해당 하므로 등골(燈洞)이라 하며 등자를 둔자로 바꾸었다.
오계리(五溪里)
옛 고천방에 따랐었고, 원오계 마을 이름에서 오계리 이름이 생겼다. 외등, 묵동, 원오계, 갈전 등 4개 마을이 있다.
- 외등(外燈) : 둔동리 원둔동을 등골 이라 할 때 "바깥등골"이라 하였다.
- 묵동(墨洞) : 옛날 먹을 만들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 원오계(元五溪) : 마을 남쪽에 솟은 대령산(719미터)의 다섯 골짜기가 마을을 향해 틔어 있으므로 오계라 하며 마을 앞의 외기들 이름을 따라서 마을을 "외기촌" 이라고 한다.
- 갈전(葛田) : 1936년 명자년 수해때 이웃 덕평(德坪)에서 옮겨 옴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무촌리(茂村里)
조선시대 본면의 서남쪽에 자리했던 고천방에 있었던 무촌역을 중심으로 한 근방을 무촌역리라 한데서 리동 이름이 생겼다. 상매, 하매, 무촌, 인평, 성지, 지하 등 6마을이 있다.
- 상매(上梅) : 마을 남서남쪽 3킬로미터에 있는 감악산 북동 어귀에 있는 매산(梅山)마을 윗담이다.
- 하매(下梅) : 매화꽃이 땅에 떨어진 명당자리(梅花落地說)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매산이라 하고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겼으므로 마산(馬山)이라고도 하다가 윗매산이 분리되자 하매라 하게 되었다.
- 무촌(茂村) : 마을이 크고 붐볐으며 숲도 무성했으므로 이름 되었다.
- 인평(印坪) : 마을 모양이 도장과 같이 생겼다하여 인평, 밭 가운데 자리함으로 밭듭이라고 부른다.
- 성지(聖旨) : 마을 터가 좋아서 많은 어진 사람들이 날 것이라는 한 도승의 말에 따라 이름 지었다 하고, 성조동(聖祚洞)이라고도 썻으며, "성짓골"이라고 부른다.
- 지하동(池荷洞) : 옛날 청림방에 따랐던 마을이다. 조선 초기에 마을 앞들에 진양 허씨가 살면서 많은 급제가 났으며 그때는 천화동(天火洞)이라 하였다. 마을 터가 못 위에 뜬 연꽃(連花浮沼)과 같다 하여 못지, 연꽃하, 지하동이라 한다.
송변리(松邊里)
청림방에 따랐던 마을이다. 솔숲이 울창하여 이름되었다고도 한다. 고려말 거제현이 가조에 옮겨와서 거제에 있어던 속현의 이름을 따라 송변현(松邊縣)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영조 36년(1760)에 만든 거창부여지승람에 고적 아주촌(古跡 鵝州村)이라는 제목 아래 잔글로 "거제가 가조에 와 있으면서 본 섬안에 있었던 속현과 역원을 가조 땅에 두었는데 아주현은 거창부의 동쪽 심리에 두고, 송변현은 무촌역 남쪽 오리에, 오양역(烏壤驛)도 가조의 서쪽에 있었으니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는다."라고 적혀있다.
대산리(大山里)
조선시대 청림방에 따랐고, 대현 마을의 대자와 한산 마을의 산자를 따서 대산리라 하였다. 괴화, 이인, 한산, 가곡, 대현 등 5마을이 있다.
- 괴화(槐花) : 괴화나무가 있으므로 생긴 이름이고, 앞내 대산천(大山川)이 바다처럼 고여 있고, 마을이 정자 같아서 해정(海亭), 해지이라고도 한다.
- 이인(里仁) : 조선 초기에 생긴 마을이라 하며 많은 선비들이 모이던 어진 마을이라 하여 이름되었다. 마을 가에 푸른 숲이 있어 청림 (靑林) 이라고도 한다.
- 한산(寒山) : 마을이 산을 지고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어 겨울에 눈이 오래까지 녹지 않아 이름 되었다고, 마을 뒷산에 좋은 차가운 물이 샘솟으므로 이름하였다고 한다.
- 가곡(佳谷) : 옛날 기와집이 많아서 좋은 곳이라는 뜻에서 가곡이라 하고 가얏골 이라고 부른다. 마을 언저리에서 가야 토기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 대현(大峴) : 마을 북동쪽 어귀에 있는 고개길을 한대고개 라고 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어 한대곡 이라 하며, 조선 초부터 생긴 마을이라 한다.
월평리(月坪里)
마을 뒷산인 낙하산이 반달 모양이고, 앞에 넓은 우암들이 있으므로 월평 이라 한다. 옛 남흥방에 따랐으므로 남흥이라고도 하였다. 월평과 평촌 두 마을이 있다.
- 월평(月坪)
- 평촌(坪村) : 우암들 가운데 자리하여 황강 건너 무덤실과 마주 보고 있으므로 들무덤실 이라고 부른다.
전척리(剪尺里)
전척, 괘리, 명산동, 고척 등 4마을이 있다.
- 전척(剪尺) : 옛날 이 마을에 척법(尺法)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전자불 이라 부르고 전척(典尺)이라고 썼다.
- 괘리(掛履) : 임진왜란때 마을 앞 냇가 나무에다 많은 집신을 걸어 놓고 위장하여 적의 침입을 막았다하여 "신거리"라고 한다. 합천댐 공사로 옛 마을은 없어지고 지금은 길위 높은 곳으로 옮겼다.
- 명산동(名山洞) : 마을 뒷골짜기에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는 고목생화(枯木生花)명당이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마을 이름도 "명산골"이라 한다.
- 고척(古尺) : 마을 근처에 금상옥척(金箱玉尺)이라는 명당 자리가 있다하여 고척, 또는 고자실이라 한다.
임불리(壬佛里)
옛날 남흥방에 따랐고, 본면의 동쪽끝에 자리하여 북쪽은 황강으로 남하면과 경계하고, 동쪽은 합천군 봉산면, 남쪽은 신원면에 맞닿는다. 임불, 남불, 월포, 세 마을이 있다.
- 임불(壬佛) : 북쪽 임방(壬方)에 새벽에 스님이 부처에게 예를 드리는 명당터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하고, 옛날 사불랑리(沙佛郞里) "사부래이"라고 하였다.
- 남불(南佛) : 예 남흥방에 따랐었고 남평(南坪)이라고도 하였다.
- 월포(月浦) : 마을은 초생달 같고, 마을앞에 황강물에 접하므로 월포라 하고, 예전에는 마을 뒤에 대밥이 있어 뒷대 또는 북죽(北竹)이라고도 하였다.
춘전리(春田里)
임진왜란때 엄능(嚴陵)이라 하다가 뒤에 지금의 내춘을 중심으로 엄전(嚴田)이라 하여 "음지이"라고 부른다. 안의현의 황곡리(黃谷里)에 따랐었고, 안의면에 속하게 되어서 밭이 많은 곳이라 춘전이라 했다하며, 1973년에 남상면에 붙였다. 남영, 내춘, 외춘, 교동 등 4마을이 있다.
- 남영(藍嶺) : 옛날 엄씨성을 가진 신선같은 사람이 살던 언덕이라 엄능이라 불렀고, 임진왜란때 밀양박씨가 처음으로 푸른 풀을 헤치고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남재"라고 부른다.
- 내춘(內春) : 엄능에서 논밭을 일구어서 옮겨 옴으로서 마을이 생겼다하여 엄전(嚴田) 또는 안음지이라 한다.
- 외춘(外春) : 내춘보다 뒤에 생겼으므로 새터 또는 바깥음지이라고 한다.
- 교동(校洞) : 마을에 주막이 있어 "주막담" 이라하다가, 광복 후 춘진초등학교가 서고나서 부터 교동이라 한다.
진목리(眞木里)
마을 가에 참나무가 많아서 진목, 진목지이라고 하다가, 1973년 안의면에서 남상면 진목리로 바뀌었다.
=====================================================
위천면(渭川面)
본군의 서부 가운데에 자리하여, 동쪽에 고제면, 주상면, 남쪽에 마리면, 북쪽에 북상면과 맞대이고, 서쪽은 금원산과 기백산의 산줄기를 경계로 함양군과 만난다. 북상면, 마리면과 함께 본군의 서부를 이루면서 가야, 신라, 고려때 염례, 남내, 여선, 감음으로 부른 행정구역으로써 그 치소의 소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면의 가운데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위천 냇물의 동쪽을 안의군의 북쪽 끝자리인 북상면에 이어서 북하면(北下面)이라 하고, 황상(黃山), 당산(堂山), 무어(舞於), 월치(越峙) 등 4개 리를 두었다. 위천 서쪽에 고려 때 감음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고현면(古縣面)을 두고, 거차(居次), 사마(司馬), 우곡(牛谷), 강남(江南), 상천(上川), 신계(申溪), 부곡(婦谷), 마항(馬項), 강동(薑洞), 역동(墿洞) 같은 10개 리가 있었다. 1914년 두면을 합하여 가운데 냇물의 이름을 따서 위천면이라 하였다. 지금은 장기리, 남산리, 상천리, 황산리, 당산리, 모동리, 강천리 7개 리로 되어 있으며 본 군 서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장기리(場基里)
장기, 창촌, 사마, 거차 4마을이 있다.
- 장기(場基) : 옛 고현면에 따랐고, 장터가 있으므로 "고현장터" 또는 "장터"라고 한다.
- 창촌(倉村) : 삼한시대부터 나라의 광이 있으므로 "창말"이라 하며, 안의군 고현면 신계리(申溪里)였다. 신계는 옛 남내(南內)에서 생긴 이름이다. 가야, 신라, 고려시대의 치소가 있었던 곳이다.
- 사마(司馬) : 안의군 북하면의 서쪽끝에 자리함으로 서말리(西末里), "서마리"라 한다는 말이 있다. 조선 초기 초계인 정제안(鄭齊安)이 초계에서 옮겨와 살았으므로 마을이 되었다고 본다. 정제안을 비롯하여 사마시에 합격한 8사람의 생원, 진사가 났으므로 사마리라 이름하였다.
- 거차(居次) : "거차리"라 한다. 조선 초기에 생긴 마을이라 한다. 마을 서쪽에 학담이 있어 석학동(石鶴洞)이라 불려오다가 한 스님 의 권유로 거차리로 고쳤다고 한다.
남산리(南山里)
옛날에는 우곡(牛谷里)에 따랐던 곳이며, 위천의 남쪽 끝 산밑에 자리하므로 붙인 이름이다. 남산동, 금곡, 호동, 가현, 화로곡 등 5개 마을이 있다.
- 남산동(南山洞) : 마을 서쪽에 금원산이 있고, 동쪽 위천에는 학담이 있으므로 원학동(猿鶴洞)이라고 하다가 조선 명종 때부터 남산동이라 부른다.
- 화로곡(花老谷) : 남산동 동쪽, 위천냇물 건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하류골"이라 한다.
- 금곡(金谷) : 고려말 거창 유씨(劉氏)에 의해서 생긴 마을이다. 쇠실, 우곡(牛谷) 등으로 쓰였고, 쐬실 이라고 부른다.
- 호동(狐洞) : 여시골이라 한다. 서덕들 동쪽끝에 남향한 작은 마을이다. 조선 중엽에 생겼다고 한다.
- 가현(佳峴) : "가재"라 하며, 사방이 산에 쌓여 삼한곡(三韓谷)이라고 하는데 고려 때부터 있었던 마을이라고 한다.
상천리(上川里)
본 면의 서쪽에 높이 솟은 금원산의 동쪽 기슭에 펼쳐진 곳이다. 상천, 서원, 덕거, 후방, 강남불, 점터 등 6개 마을이 있다.
- 상천(上川) : "상처이"라고도 부른다.
- 서원(書院) : 고려 때의 판서 경부흥(慶復興)을 모시던 덕천서원(德泉書院)이 있었으므로 "서원땀"이라 한다.
- 강남불(江南佛) : 고려 숙종 때(1096 ~ 1105) 마을이 열렸다고 전한다. 마을이 생길 때까지 강남사(江南寺)가 있었다고 전하며, 지금도 석불이 남아있다.
- 점터(店基) : 금원산 동쪽 기슭에 있다. 금원산 곳곳에서 쇠를 모아서 이곳에서 연장을 만드는 점이 있었다. 정희량이 여기에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화강석 채석장이 있다.
황산리(黃山里)
원황산의 지형이 노루의 목과 같다하여 노루목이라 불리어 오다가 조선 중엽 이후 황토백산(黃土百山)에서 황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원황산, 어나리, 동촌 등으로 나눈다.
- 황산(黃山) : 황산 큰마을은 18세기 중엽에 황고 신수이(黃皐 愼守彛)가 새로 마을터를 잡은 거창 신씨의 집성촌으로, 영조 이후 인물이 연이어 배출되었던 곳이다. 원황산 마을 근처에 몇 채 씩의 집으로 된 작은 마을이 있다.
- 어나리(院下里) : 구연서원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생긴 이름이다. 달빛아래 수승대에서 척수대로 흐르는 냇물과 냇가의 흰 돌이 은하수같이 비치므로 은하리(銀洞里)라고도 하였고, 물고기를 잡는 곳이라 어천(漁川)이라 쓰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 동촌(東村) : 황산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 동쪽에 있으므로 동촌이라 하며, 웃말, 죽바우, 서원, 뒷골을 엎쳐서 동촌이라 하는데 조선 초기에 창녕조씨가 마을을 일으켰다고 한다.
- 당산리(棠山里) : 옛 안의군의 북하면에 들었고, 조선 초기 변씨(邊氏)가 살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마을 근처에 아거이 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당산과 영풍 두 마을이 있다.
- 당산(棠山) : 옛 북하면의 치소가 있었던 곳이다. 마을 앞산에 변씨들의 옛 무덤이 있다.
- 영풍(咏風) : 당산 북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 영풍정(咏風亭) : 초계인 정기(鄭紀)가 시를 읊 조리던 곳에 세웠으나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모동리(茅東里)
위천면의 동북끝에 자리하여 호음산에 매봉, 석부산, 취우령으로 동쪽 경계를 이루어서 고제면과 주상면에 맞대인다. 모전, 석동, 무월, 원당 4개 마을이 있다.
- 모전(茅田) : 조선 시대에는 모서리(茅西里)라고 하였고, 띠밭말 이라 부른다. 원당, 무월까지를 통털어서 모전이라 했다.
- 석동(石洞) : 석부산(石釜山)밑에 있으므로 이름되었고, "독점"이라고 한다.
- 무월(舞月) : "멀이"라고 한다.
- 원당(元塘) : 모동에 따른 작은 마을로 "원대이"라 한다.
강천리(薑川里)
고려말 이예(李芮)가 살던 곳이므로 그의 호에서 마을과 앞 냇물의 이름을 강천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강동, 마항, 면동 등 세 마을이 있다.
- 강동(薑洞, 干洞) : 마을이 버드나무에 꾀꼬리 둥지가 있는 형국이므로 유지양소(柳枝鶯巢)설이라, 소앵골(巢鶯谷)에서, 또는 정제안(鄭齊安)이 생강을 농사지었기에 강동, 또는 "새앙골"이라 한다. 마을의 동북쪽을 역골(嶧洞)이라 하는데, 본래는 문주동(文冑洞)이 있었다고 하며, 고려말 효자 반전(潘晪)이 살던 곳이다.
- 마항(馬項) :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아래 자리하므로 "말멕이"라고 하며 고려말 합천 이씨가 처음으로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면동(眠洞) : 고려 중엽부터 강양 이씨가 마을을 열었다 하고, 며느리가 자리를 잡았으므로 며느리실 부곡(婦谷)이라 하던 것을 "미너실"이라 하게 되었다. 마을이 잠자는 소의 형국이라 하여 면우동(眠牛洞)이라고도 하다가 면동이라 하게 되었다.
============================================================
고제면(高梯面)
옛날 성초역(省草驛)으로 가는 길목에 한 도승(道僧)이 놓았다는 높이 6미터, 길이 11미터의 큰 돌다리를 "높은다리"라 하였는데, 이 다리 이름이 곧 면이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북창리(北倉里), 입석리(立石里), 개명리(開明里), 손항리(遜項里), 수다리(水多里), 성초역리(省草驛里), 둔대리(屯垈里), 임당리(林塘里) 8개 리가 있었고, 지금은 농산리, 개명리, 봉계리, 봉산리, 궁항리 5개 리로 나눈다.
본 군의 북쪽 끝에 자리하여 대덕산과 삼봉산으로 뻗은 소백산맥이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대덕산에서 동남쪽으로 내미는 가지는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룬다. 본 면의 동쪽은 웅양면, 서쪽은 북상면, 남쪽은 주상면과 맞 닿는다. 본 면의 복판을 북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 동쪽을 큰골이라 하며, 봉계리, 봉산리, 궁항리가 있고, 도마현(道磨峴)을 넘어 무풍(茂豊)에 이어진다. 서쪽 골짜기를 작은골이라 하며 개명리로서 빼재(秀嶺)를 넘어 구천동으로 통한다. 큰골과 작은골이 어울리는 본면의 남쪽 끝에 농산리가 있다.
농산리(農山里)
본 면의 남서쪽 끝에 자리하여 주상면, 위천면, 북상면과 맞닿는다. 원농산, 금계, 입석, 손항, 온곡 다섯 마을이 있다.
- 원농산(元農山), 성가막골 : 400여 년 전에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어 "성가막골"이라고 한다. 왕무덤골 : 마을 남쪽 200미터, 주상면과의 경계 산속에 있는 골짜기, 옛날 싸움에서 죽은 장수의 무덤이라는 큰 무덤 인 왕무덤이 있다.
- 금계(金鷄), 접재실 : 원농산의 냇가 동쪽 한쪽을 금계라 하며 이전에는 "접재실"이라 하였다.
- 입석(立石) : 고제면 사무소 소재지로서 고려 때에는 절터였다고 하며 큰 돌이 서 있으므로 선돌, 입석이라 한다. 높은 다리가 있었 으므로 높은다리 고제라는 이름이 생겼다. 신선들이 살던 곳이라 선들, 선평(仙坪)이라고도 하였다.
- 손항(巽項), 솔목 : 마을 북쪽 손방(巽方)이 좁고, 솔다하여 "솔목"이라 한다. 약 300년 전 팔계 정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온곡(溫谷), 더우실 :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늑하므로 "더우실"이라 한다. 260 ~ 70년전에 경씨와 양씨(慶氏, 梁氏) 들이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개명리(開明里)
본디 이 골짜기를 거문골이라 하였다가 300여 년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개명하였으므로 개명골이라 한다. 수유동, 괘암동을 개명리 1구, 2구에 개명골이 있고, 북쪽 끝에 물안실이 있다.
- 수유동(水踰洞), 무너미 : 마을 뒷산너머 개발골 골짜기 물을 끌어 넘겨서 농사지었으므로 "무너미"라 한다. 250여 년 전 진양 하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괘암동(掛岩洞) : 마을 뒤 농삿길에 긴 돌이 길 가운데 걸려 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250여 년 전 경주 김씨가 삶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 개명골(開明 2區) : 300여 년 전 성산 배씨가 마을을 열었다 하며, 상개명과 하개명 두 담으로 나눈다.
- 수내(水內), 물안실 : 마을 곁의 냇물이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하여 "물안실"이라 한다. 옛날에는 수다리(水多里)라 하였다. 300여 년 전 진양 하씨가 마을을 열었다.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빼재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삼포, 하수내, 신기골터, 상수내, 빼재 같은 작은 마을이 흩어져 있다.
봉계리(鳳溪里)
탑선, 지경, 소사, 원기, 원봉계, 내다 여섯 마을이 있다.
- 탑선(塔仙) : 옛날 죽산 전씨(竹山全氏)가 마을을 열었다 하며 마을 앞에 높이 1미터의 2층 석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 원탑선을 "탑서이"라 하고 서쪽에 소사, 북쪼겡 지경이 있는데 이들 세 담을 통틀어서 "탑서이"라고 부르며, 대덕산과 삼봉산 사이에 안긴 높이 700미터의 고냉지대이다.
- 지경(地境) : 옛날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으며 지금의 영, 호남의 경계이다. 경상도 땅 안에 있으므로 "지경내"라고 하며 장포 (長浦)라고도 썼다.
- 원기(院基) : 옛날 성초역에 따른 원(院)이 있었으므로 원터라 한다.
- 원봉계(元鳳溪) : 옛날 마을 근처 골짜기마다 불당이 많아서 "당골"이라 하다가 한말 이곳에 살면서 동학혁명 때 치안유지에 공이 있었다는 하종호(河宗浩)의 호 봉서(鳳棲)에서 새봉자를 따서 봉계라 고쳤다 하고 300여 년 전 엄씨(嚴氏)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봉산리(鳳山里)
서북쪽에 솟은 두루봉이 봉황새 모양이라 봉산리라 한다.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네 마을이 있다.
- 와룡(臥龍) : 마을 뒤편에 삼봉산이 솟아있고 땅 모양새를 보고 용강(龍崗)이라 하다가 와룡 선생이 시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300여 년 전 인천 채씨(仁川 蔡氏)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용초(龍草) : 광복 후에 용호동(龍胡洞)과 성초(省草) 두 마을을 어울러서 붙인 이름이다. 성초는 옛날 성초역이 있던 곳이다. 300여 년 전 밀양 박씨들이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구송(九松) : 괴정, 구룡, 송정(槐亭, 九龍, 松亭) 세 마을을 광복 후에 합쳐서 지은 이름이다. 300여 년 전에 삼척 진씨(三陟 陳氏)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둔기(屯基) : 옛날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라 "둔터"라 하고 400여 년 전에 손, 오, 강(孫, 吳, 姜) 세 성씨가 살았으므로 "손오강터" 라고도 한다.
궁항리(弓項里)
고제면의 큰 골 남쪽 어귀에 자리하고, 북쪽에 학림, 동쪽에 원궁항, 남쪽에 산양이 자리 잡고 있다.
- 매학, 방학, 임당 : 세 마을을 광복 후 합하여 학림이라 하였다. 300여 년 전에 합천이씨가 들어와 삶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하고 매학(梅鶴)은 매화나무와 학이 있었다 하고, 방학(放鶴)에도 학이 있었으며, 임당(林堂)은 지금은 없어졌으나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였다고 전한다.
- 원궁항(元弓項), 활목 : 마을 둘레의 산과 마을 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활과 같아서 "활목"이라 한다. 260여 년 전에 신창 표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산양(山陽), 뫼너미 : 산 넘어 남쪽을 바라보는 마을이라 산남(山南) "뫼너미"라 하다가 산 밑의 양지 바른 곳이라 산양으로 바뀌었다. 300여 년 전에 삼척 박씨가 함양 수동에서 옮겨 옴으로써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
주상면(主尙面)
본 군의 중앙부에 자리하며, 조선시대에는 동쪽을 지상곡면(只尙谷面)이라 하여 성기역리(星奇驛里), 장생동리(長生洞里), 고대리(古大里), 보광리(寶光里), 도평리(道坪里) 등 5개 리로 나누고 면사무소는 도평리에 두었다. 서쪽은 옛 거창군의 큰 골짜기라 이르는 주곡면(主谷面)이라 하고, 연제리(連梯里), 완계서원리(浣溪書院里), 완서리(翫逝里), 오산리(烏山里), 오리동리(梧李洞里)등 5개 리로 나누고, 연제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가, 1913년에 두면을 합하여 주상면이라 했다. 연제리에 있던 면사무소를 1920년에 도평리에 옮겼다. 지금은 도평리, 연교리, 내오리, 완대리, 성기리, 거기리, 남산리 등 7개 리로 나누었다.
도평리(道坪里)
도평 1구의 도평과 봉황대 2개 마을, 도평 2구의 상도평 등 3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8월 14일 도평1구를 도평(道坪)으로 도평2구를 상도평(上道坪)으로 변경 하였다.
- 도평(道坪, 뒤평), 봉황대(鳳凰臺) : 큰 길 뒤에 있는 들이라 후평(後坪), 뒤평이라 했으며, 고려 때 박첨지(朴僉知)가 여기서 두문수도(杜門修道) 하였으므로 도평(道坪)이 되었다고 한다.
- 봉황대(鳳凰臺) : 본시 황산(黃山)이라 하다가 15세기 중엽 선산 영봉리(善山 迎鳳里)에서 옮겨온 선산김씨들이 누대의 묘를 들이고 고향을 기려서 새봉자를 넣어서 봉황대라 이름 지었다. 또 세산과 두 물이 어울리는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경치 좋은 곳이라, 중국의 봉황대 이름을 빌린 것이기도 하다.
- 상도평(上道坪) : 도평마을 위쪽에 자리하며,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 양쪽에 있다. 임진왜란 때 주상면 남산리에서 평산신씨가 옮겨와서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연교리(連橋里)
연교리에서 고제면 삼봉산(三峰山)까지 북쪽으로 트인 골짜기를 심원동(尋源洞)이라 한다. 옛날 큰길의 두 다리가 이어져 있으므로 연제리(連梯里)라 하고, 지상곡면의 면사무소가 생기면서 착실한 인심에 맡긴다는 뜻에서 임실(任實)이라 불렀다. 연교1구에 마을 가운데 도랑을 경계로 상임실(上任實), 하임실(下任實), 연교2구에 막터(幕基), 서잿골(書齋谷)등 4개 마을이 있다. 2006년 8월 14일 연교1구를 임실(任實)로 연교2구를 연교(連橋)로 변경 하였다.
- 상임실(上任實), 하임실(下任實) : 300여년 전에 경주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 하며 부자가 많이 산다고 "부석마"라고도 한다.
- 하임실(下任實) : 아래임실, "이음다리"라 한다.
- 막터(幕基), 서잿골(書齋谷) : 오무(내오산)의 청도 김씨들이 농막을 지었으므로 막터라 하고, 외오산(外鰲山)이라고도 한다.
- 서잿골(書齋谷) : 약 200년 전 경주김씨의 선조 원추, 극추, 근추 (元樞, 極樞, 謹樞) 세 형제가 시묘하던 자리에 서재를 짓고 임실에서 옮겨 살면서 마을이 생겼다.
내오리(內吾里)
내오리는 내오1구의 오무, 새터 2개마을, 내오2구의 오륫골 등 3개마을로 나누어지며, 내오리 이름은 오무마을 이름에서 생겨난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내오1구를 오무(鼇武)으로, 내오2구를 오류동(五柳洞)으로 변경 하였다.
- 오무(鰲山), 새터 : 15세기 말 연산조 사화 뒤 김포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청도 김일동(淸道 金逸東)이 고향 청도의 옛 이름인 자라 '오'자 오산(鰲山)으로 바뀌었다. 오산이 오무로 변했으며, 막터를 바깥 오산, 외오라 하고 오무를 내오라고 한다.
- 새터마을 : 오무마을 북서쪽 내 건너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 오륫골(五柳洞) : 500여년 전 밀양 박씨가 세운 마을이라 한다. 풍수설에 마을 터가 버들가지에 꾀꼬리가 둥지를 짓는 유지앵소(柳枝鶯巢) 형국이므로 이렇게 이름 붙였다 한다.
완대리(玩坮里)
완대 1구인 완수대와, 완대2구인 도동 완대3구인 넘터(완계) 3개 마을로 나눈다. 2006년 8월 14일 완대1구를 완수대(玩水臺)으로, 완대2구를 도동(道洞) 완대3구를 넘터로 변경 하였다.
- 완수대(玩水臺) : 옛날에는 완서대(玩逝臺)라 하였고, 물을 구경하는 놀이터가 있으므로 완수대로 고쳤다 하며, 300여년 전 엄씨 형제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도동(道洞) : 옛날 조 농사를 많이 하여 "조동"이라 하였고, 300여년 전 영천 이씨 죽헌 이영신(竹軒 李永信)이 단종 복위를 위한 세조 때 사화를 피하여 옮겨 옴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 완계(浣溪) 넘터 : 옛 안의군 북하면 모동으로 넘어가는 잿길에 자리하여 "넘터" 월치(越峠)라 하다가 완계서원이 서고나서 완계라 하였으며, 300여년 전 밀양인 박윤보, 재보(朴潤輔, 再輔) 형제가 이룬 마을이라 한다.
성기리(聖基里)
옛날에는 별 '성', 이상할 '기' 성기(星奇)라 하였고, 성기역(星奇驛)이 있었다. 고려 때 주씨(朱氏)가 이룬 마을이라 전한다. 성기1구에 원성기와 홍석동, 성기2구에 신촌, 미기동, 성기3구에 송정, 희동 6개 마을이 있다. 희동에서 고려왕사 희랑대사가 났으므로 성스러운 분의 출신지라하여 성인 '성', 터 '기' 자를 써서 성기(聖基)라 고쳤다 한다. 2006년 8월 14일 성기1구를 원성기(元聖基)으로, 성기2구를 정동(停洞), 성기3구를 송희(松希)로 변경 하였다.
- 원성기(元聖基), 흥석동(興石洞) : 성기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흥석동(興石洞)은 마을 앞 당산에 있는 넓다란 바위를 흥석이라 하고 여기에 따라 마을 이름이 되었다.
- 신촌(新村), 미기동(米基洞) : 철종 14년(1863) 9월 큰 불로 마을이 없어지고 500미터 내려와서 새로 마을을 지어 새터라 한다. 미기동(米基洞)은 마을 앞들이 쌀 농사가 잘 되므로 미기들이라 하며 마을 이름도 거기서 생겼다.
- 송정(松亭, 송지이), 희동(希洞, 희터) : 수원 백씨가 세운 마을로 이 옛날 마을에 무성한 소나무 숲이 있었다.
- 희동(希洞, 희터) : 신라 진성여왕 3년(889), 희랑대사(希朗大師)가 태어난 곳이다. "희터"라고 부른다.
거기리(渠基里)
거기1구의 거기, 거기2구의 외장포, 내장포, 거기3구의 고대 등 4개 마을로 나눈다. 2006년 8월 14일 거기1구를 거기(渠基)로, 거기2구를 장포(長浦), 거기3구를 고대(古垈)로 변경 하였다.
- 거기(渠基, 걸터) : 성주 여씨가 이룬 마을이라 하고, 옛날에는 돌이 많으므로 "돌밭"이라 하다가, 개울이 마을을 끼고 흐르므로 "걸터"라 한다.
- 장포(長浦) :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성불", 노루장자 장포(獐浦)라고도 하였고, 임진왜란 때 옮겨온 유성근(柳成根)이 103세를 살고 그 아들도 93세를 살았으므로 장생동(長生洞)이라고도 하였다.
- 고대(古垈) : 500여년 전 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오래된 터라 고대(古垈), 느티나무가 있었다하여 괴대(槐垈)라고도 쓴다.
남산리(南山里)
남산1구의 남산동, 시락골, 남산2구는 덕동, 서변동, 남산3구의 상보광, 중보광, 개울보광 등 7개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2006년 8월 14일 남산1구를 원남산(元南山)로, 남산2구를 포덕동(飽德洞), 남산3구를 보광(寶光)으로 변경 하였다.
- 남산동(南山洞), 시락골 : 오랜 옛날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묵은터"라고 하며, 파주 염씨가 이룬 마을이라 전한다.
- 시락골 : 묵은터 북서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10 ~ 15호의 작은 마을.
- 덕동(德洞, 덤마), 서변동(西邊洞) : "덤마"라고도 한다. 도사가 덕유산이 마주 바라보이니 덕동으로 함이 좋다 하여 고쳤다고 전한다.
- 서변동(西邊洞) : 남산동의 서쪽편에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성산 이씨와 평산 신씨가 이룬 마을이라 전한다.
- 웃보개이(上寶光), 중보개이(中寶光, 서재보개이), 개울보개이 : 이 골짜기에서는 가장 북쪽에 자리하며, 300여년 전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 중보개이(中寶光, 서재보개이) : 용포 백동근(龍埔 白東根)의 서재가 있었으므로 서재보개이(書齋寶光)라고 하며, 250여년 전에 백상문(白尙文)이 마을 을 열었다고 전한다.
- 개울보개이 : 개울가에 있으므로 "개울마"라고도 하며 250여년 전 백의립(白儀立)형제가 장수(長水)에서 옮겨와 살았다.
==========================================================
가조면(加祚面)
석강리(石岡里)
생초, 왕대촌, 평촌, 동산하, 도촌, 재동의 6마을이 있다.
- 생초(省草) : 임진왜란때 말먹일 풀을 대었으므로 이름 붙었다고하고, "소세"라고 부른다.
- 왕대(王大) : 전설에 임금이 날 마을이라 하여 이름되었는데 중년에 임금 왕자와 큰대자를 합하여 구경할 롱자로 바꾸어 농촌(弄村)이라 하다가 1995년에 본래대로 되찾았다.
- 평촌(坪村) : 들가운데 있는 마을이므로 "들마"라 한다.
- 동산하(東山下) : 동산 밑에 있으므로 "동산밑"이라 부른다.
- 도촌(道村) : 옛날 왕족들이 살았다 하여 도읍 도자(都) 도촌이라 하던 것을 길 도자로 바꾸었다.
- 재동(齋洞) : 고려때 마을 앞을 "꽃동마(花동村)"라 하였고, 양씨(楊氏) 부자가 서재를 짓고 살았던 곳을 "서재골(書齋洞)"이라 하였고, 지금의 기리의 장대들, 대초의 사당배미 같은것도 양씨들이 살던 때에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기리(基里)
양기, 음기, 광성, 학산의 4마을이 있는데 양기, 음기를 함께 텃골(基洞)이라 한데서 기리 라는 이름이 생겼다.
- 양기(陽基) 텃골 : 옛날에는 양기, 음기를 통털어서 기동, 텃골이라 하다가 일제 때 양기, 음기로 나누었다.
- 음기(陰基), 텃골 : 양기와 함께 텃골(基洞)이라 하여 가남(加南)면에 따랐었다.
- 광성(廣城) : 옛날에는 "수구막"이라 하였고, 이곳에 조산을 만들면 가조가 빛난다 하여, 온 가조에서 돈을 거두어서 조산을 쌓고 이름을 광성이라 하였다.
- 학산(鶴山) 서리터 : "서리터" 상현(霜峴)이라고도 한다. 무학대사가 쉬면서 땅세가 학같다 한대서 한자를 따고, 높은 곳에 자리 함으로 산자를 넣어서 학산이라는 이름을 1950년에 청암 이담(靑庵 李淡)이 지었다고 한다.
대초리(大楚里)
대초, 방촌 2마을이 있다.
- 대초(大楚) : 대추나무가 호수처럼 울창하였으므로 조호(棗湖) 또 "대추마"라 하다가 대초라 한다.
- 방촌(旁村) : 군위 방이망(方以望)이 1237년에 마을을 이루었고, 방호망(旁湖洞)이라 하다가 1940년에 바꾸었다.
동례리(東禮里)
안금, 중평, 동례 3마을이 있다.
- 안금(安琴) : 지형이 거문같아서 누를 안, 거문고 금, 안금(按琴)이라 하다가, 편알안 자로 바꾸었다.
- 중평(中坪) : 박유산 날끝에 있는 마을로서 중촌(中村)과 평촌(坪村)을 합하여 중평이라 한다. 중촌은 동예와 안금의 가운데 있어서 이름되었고, 평촌은 들판에 있으므로 이름되었다.
- 동례(東禮) : 중종 14년(1519)에 있었던 기묘사화때 사직 벼슬을 버리고 내려온 신윤지(愼胤智)가 은거하면서 예의를 숭상했으므로 예곡 또는 예동(禮谷, 禮洞)이라 하다가 박유산의 동쪽 마을이라서 동유골(東儒谷), 동예라고 했다.
장기리(場基里)
역촌, 부로동, 모덕동, 장기, 원천, 신천 외 6마을이 있다.
- 역촌(驛村) : 옛날 역이 있어서 이름되었다.
- 부로동(扶老洞) : 오래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부롯골 이라 한다.
- 장기(場基) : 1953년까지 가조장이 있었으므로 "장터"라 한다.
- 원천(源泉) : "샘내", 정천(井川)이라고 한다. 대사헌 증직을 받은 죽산인 전팔고(全八顧)의 호 원천(源泉)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
- 신천(新泉) : 북같이 생기고 , 둥둥소리가 난다하여 "둥디"이라 하였다.
사병리(士屛里)
병산, 창촌, 당동 3마을이 있다.
- 병산(屛山) : 마을 뒷산에 장군령(將軍嶺)과 장군 바위가 있고, 장군이 있으면 병사가 있어야 함으로 병산(兵山)이라 하다가, 뒷산이 병풍같으므로 병산(屛山)이라 하였다.
- 창촌(倉村) : 고려 때부터 가소현 창고가 있었으므로 창마라 한다.
- 당동(堂洞) : 마을 서쪽 100여m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당사가 있어서 땅골이라 한다.
마상리(馬上里)
가조면 사무소의 소재지리 옛날 삼 농사를 많이 하여 마촌(魔村) 마치마라고 하였으며, 상마(上馬), 중마(中馬) 1구 중마 2구로 나눈다.
수월리(水月里)
월포, 용당소, 상수월, 용전 외 4마을이 있다.
- 월포(月逋) :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월포라 이름하였다.
- 용당서(龍塘所) : 마을 뒤에 용소(龍沼)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 상수월(上水月) : 수옥동(水玉洞)으로 불어오다가 일제때 대방곡(大芳谷)과 양동을 합하여서 상수월이다 하였다.
- 용전(龍田) : 옛날 향교가 있어서 향교말이라고도 한다. 마을앞에 해덕들(海德坪)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따라 용전이라 한다.
일부리(一釜里)
옛 상가남면에서 가동면으로 바뀌었던 곳으로 도산, 부산, 녹동의 3마을이 있다.
- 도산(道山) : 도산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름되었고, 원촌(院村)이라고도 하였다.
- 부산(釜山) : 옛날 무학대사가 지형이 가마솥설이라 하였으므로 이름되었다고 전한다.
- 녹동(鹿洞) : 마을 형태가 달아나는 노루가 어미를 돌아보는(走獐顧母)것 같다하여 장항동(獐項洞)이라 하다가 노루메기, 노동(櫓洞)이라고도 불렸으며, 근래 녹동으로 하였다.
도리(道里)
도산동, 화곡, 대학동의 3마을이 있다.
- 도산당(道山堂) : 도동(道洞)으로 불러 오다가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어서 산자를 넣어서 도산(道山)으로 하였으나 또 같은 마을이 있으므로 도산당으로 고쳤다고 한다.
- 화곡(禾谷) : 진재해(秦再奚)의 호 벽은(僻隱)을 따라 벽은동이라 하다가 견곡(堅谷)으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으며, 진씨(秦氏)가 많이 살므로 진자 밑의 벼화(禾)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삼았다.
- 대학동(大學洞) : 처음에는 "홍강포(鴻江浦)"라 하다가 15세기 중엽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이 평촌의 최숙량(崔淑梁)과 글을 가르칠 때 대학동이라 고쳐 불렀다. 이 마을은 안담, 군담, 양지담 세 담으로 되어 있다.
================================================================
남하면
둔마리
대촌, 신촌, 안흥 3마을이 있다.
대촌(大村)마을

동호와 성북으로 나눈다. "됫뫼, 큰마"라고도 하였으며 1962년부터 대촌이라 하였다. 대촌마을은 1550년께 하빈이씨가 마을을 열었으며, 뒤쪽으로 해발 709m의 금귀산(金貴山)이 자리잡고 있으며 옛날 봉수대가 있어 봉우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산정의 남쪽편에 금귀사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북동쪽 300m에 있는 재궁골(梓宮谷)은 석장골(石葬谷)이라고도 하며 사적 239호인 둔마리 벽화고분이 있는 곳이다.
신촌(新村)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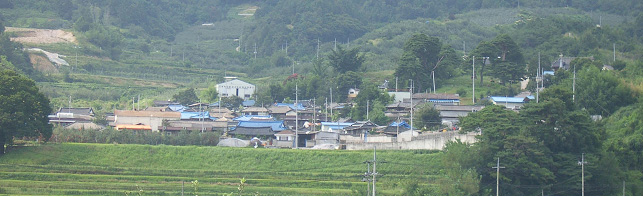
"뒷뫼새마"라고도 하며 1730년께 봉산인 이경남 (李景男)이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북서쪽 1km 불매등 북쪽 금귀산 중턱의 골짜기로 옛날 스님들이 피난가면서 부처를 묻었다고 한 불매골(佛埋谷)이 있다.
안흥(安興)마을

고려때 관안산의 갓안골에 있었던 안흥사 절 이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고 함양 오씨와 청주 한씨에 의해 창동되었다고 한다. 마을입구 지방도변에 둔마초등학교는 1953년 개교하여 1994년에 폐교되었다.
양항리
아주, 내곡, 상촌, 대곡 4마을이 있다.
아주(鵝洲)마을

고려말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남쪽 2km 떨어진 산속에 큰 방만한 자연굴인 인굴(人窟)이 있으며 옛날 사람들이 피난하였던 굴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곡(內谷)마을

1850년께 파평 윤씨와 연안 송씨가 아들을 얻기 위해 새터를 잡아 옮겨 온 연유로 "살목 새터"라고도 불린다.
상촌(上村)마을

"살목 웃마"라고도 하는데 살목이란 마을앞을 흐르는 양항천의 서쪽이 좁아서 고기잡이 살을 놓기 좋은 여울목이라 하여 생긴 이름으로 시항(矢項), 전촌(箭村이)이라 썼고 조선말까지 고모현면의 면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다. 옛날 창녕 조씨와 함종 어씨가 먼저 살았다고 전해진다.
대곡(大谷)마을

"살목 큰골"이라고도 하며, 고려말 무과급제를 했던 유형귀 장군의 전설이 있으며 뒷산에 유장군의 묘가 있다. 마을 북동쪽 아주로 가는 산골짜기 중신골에 고려때 창건한 청연사터가 있었는데 300여년 전 심소정 중건 때 뜯어서 옮겼다고 한다.
무릉리
양곡, 무릉, 월곡, 산포 4마을이 있다.
양곡(陽谷)마을

마을 남서쪽 황강냇가에 큰 바위가 있으며 벼락바위 또는 양석(陽石)이라 하였는데 450여 년 전 큰 바위 그늘을 피하여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은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1530년 신여좌가 양평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뒤쪽으로 성령산이 있으며 정상주위에 옛 성터가 150여 미터가 남아있고 월곡산성터라고도 하며 중턱에 정토사(淨土寺)가 있다.
무릉(武陵)마을

"무릉동, 무등곡" 및 "무덤실" 등으로 불리는데 삼한시대 이 부근에 陣地가 되어 전사자의 무듬이 마을뒷산에 많아서 불러진 이름이나 마을내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있었다하여 武陵이라 불리워지고도 있다. 옛 무등곡면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1914년 고모현면, 지차리면과 합하여 남하면을 만들때 면사무소를 무릉에 두게 되었으며 현재 소재지 마을이다. 마을의 서쪽을 바라보는 북쪽부분을 "넘마", 남쪽의 남, 서로 향하는 곳을 골담이라 한다. 가야시대 김해 허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전한다.
월곡(月谷)마을

마을 남쪽 어귀의 청룡날이 반달 같아서 半月山이라 하고 월이곡리(月伊谷里) "달이실"이라 하다가 현재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예종1년(1469년) 화순인 최세식이 살기 시작했고, 임진란 때 영산인 신정걸이 옮겨 왔다고 전해진다. 마을 북동쪽에 일산봉이 있으며 빼재는 잿길로서 지산리로 통한다.
산포(山浦)마을

마을뒤에는 山이 앞에는 黃江이 흐르고있어 山을 싸고 川이 흘러 내린다하여 山浦라고 불리워지나 武陵桃源을 찾아 가려면 이 마을에서 묻는다는 뜻에서 "멱실(覓谷)"이라 하였고 18세기 말엽 정조때에 광산김씨와 화순최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면사무소가 무릉(평촌)에 소재하였으나 주민불편으로 멱곡으로 이전하여 10여년간 존속하다가 1930년 무릉마을로 재이전되었다.
대야리
대야, 오가, 용동, 가천 4마을이 있다.
대야(大也)마을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대바지"라고도 하며 뒷산이 "잇기야"자 같아서, 또는 냇가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무 야(冶)" 자를 써서 대야(大冶) 또는 대바지의 "바"자를 아(雅)로 써서 대아(大雅)라고도 하였다. 마을 뒤쪽에 감투봉이 자리하며 옛날 원님이 대바지 무우맛에 반하여 사임산을 감투봉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1989년 합천댐 건설로 많은 가구가 정든 고향을 떠났으나 2004년 문화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늘고 있다.
오가(五可)마을

다섯 번은 피난할 수 있는 곳이라 "오가리"라고도 하며 한 도사가 나라안 사람이 사흘 먹을 것이 있다 하였는데 과연 이곳 금광에서 많은 금이 나왔다고 한다. 17세기 중반 효종 때 전라도 창평에서 고세징(高世徵)이 옮겨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1917년께 금광을 열어서 한때 10명의 광주 및 100여명의 광부가 50여호의 가구를 이루어 살았다.
용동(舂洞)마을

마을뒷산이 "방아공이"설이라 하고, 마을 근처에 방앗간이 있어"방앗재"라고도 하며 진양정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마을 북서쪽 뒷산에 가천에서 대야로 통하는 방앗재가 있다.
가천(加川)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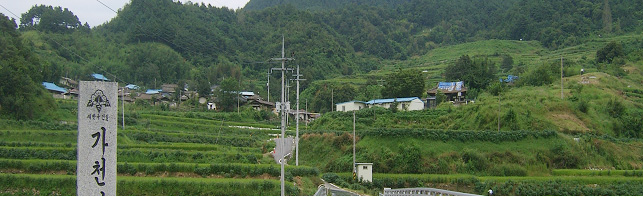
가천 냇가 산 기슭 개천이 골짜기의 가장 안쪽에 있으므로"안개천"이라고도 하며 1597년 정유재란때 추사용(秋史庸)이 영월에서 옮겨와 마을이 시작되었다 한다. 마을 북동쪽 가조방향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쇠를 만들던 점터가 있다.
지산리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5마을이 있다.
자하(紫霞)마을

처음에는 북서쪽 산기슭에 살다가 호랑이를 피해서 지금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조그마한 골짜기에 피난하여 숨어 사는 곳이라 "숨을 은(隱)"을 사용 "어은리(漁隱里), 어인골"이라 하던 것을 고종 32년(1896년) 거창부사 홍세영(洪世永)이 자하로 고쳤다. 또한 이조 22대 영조대왕 4년에 거창읍에 거주하였던 居昌劉氏들의 逃避한 곳이라는 뜻에서 隱골이라 불렀고 15세기 중엽 세조때 거창유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신기(新基)마을

지산리에서 가장늦게 생긴 마을로 "새터"라고도 부르며 15세기 전반 중종때 하빈 이씨가 옮겨 왔다고 한다. 지산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가조로 학구가 변경되었다. 화주대골은 마을에서 남서쪽 1 킬로미터 대야와 오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하빈인 이상모, 이최묵 양대가 진사가 되어 선산에 석물을 할때 화주대를 세웠던 곳이라 한다.
장전(墻田)마을

동네 터가 밭으로 둘레에 담장이 되어 있어 "담안밭"이라 부르던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으며 줄여서 "담밭"이라고도 하며 1728년 무신란 때 가조 녹동에서 성산 배씨가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남서쪽 300미터 지점에 금천골이 있으며 죽백산에 잇땋아 금이 많이 있다하여 이름하였고 일제 때 5년간 금광업이 성했던 곳이다.
천동(泉洞)마을

마을 뒤편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 "정곡리(井谷里)"라 하다가 1896년에 홍세영 부사가 천동(샘골)으로 고쳤다고 하며, 15세기 중엽 이침(李沈)이 대구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마을 북동쪽 뒷산에 장군석 날등이 있으며 임진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지세를 살펴보고 인재가 날것을 막기 위해 지도에다 붓으로 맥을 끊으니 이 날등 땅이 패이면서 피가 났다는 전설이 있다.
대사(大寺)마을

지산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로 한점리(寒店里)라 부르고, "한절골"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절은 옛 관청을 뜻함, 마을뒷산에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
마리면(馬利面)
본 군 서부의 남단에 자리하며, 본 면의 동북쪽에 솟은 취우령(驟雨嶺)에서 남쪽 건흥산(乾興山)을 향해 뻗는 산줄기가 동쪽 거창읍과 경계 짓고, 북쪽은 위천면과 맞닿으며, 남서쪽은 기백산(箕白山) 줄기가 함양군 안의면과 군계를 이룬다.
본 면은 조선말까지 위천면, 북상면과 함께 안의군에 따랐다가 1914년에 거창군에 들어왔다. 본 면의 북부는 동리면(東里面)이라하여 장백, 신벌, 영승, 상율, 하율, 월화, 사동, 신기, 지동, 등동(登洞), 주암 11개마을이 있었고,남쪽에는 고창, 구라(仇羅), 엄정, 고학 4개 마을에 남리면(南里面)을 두었는데, 남리면은 신라 경덕왕 16년(757)까지 마리(馬利)라하다가 이안현(利安縣)이 되어서 천령군(天嶺郡)에 따랐다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감음현(感陰縣)에 합쳐져서 안음현, 안의현, 안의군의 남리면이었던 것이 1914년에 동리면과 합하여 마리면이 되어서 거창군에 붙었다. 동리면은 위천, 북상과 함께 가야시대까지는 염례, 남내(稔禮, 南內)라고 하다가 757년에 여선현(餘善縣)이 되어서 거창군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에 감음현에 따랐고, 그 뒤 조선 영조 5년(1729)에서 영조 12년 (1736)까지 거창에 붙여졌던 일 밖에는 1914년까지 안음, 안의현 또는 군이었다. 지금은 영승리, 율리, 월계리, 말흘리, 고학리, 대동리, 하고리 7개 리에 23개 마을이 있다.
영승리(迎勝里)
본 면의 동쪽으로는 취우령(驟雨嶺)이 거창읍과 경계를 이루며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 아래로 위천천이 나란히 흐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취락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풍광이 매우 수려하다. 영승리에는 영승, 계동, 장백 등 3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승리라는 명칭은 3개 마을중 가장 큰 영승마을에서 비롯 되었다.
- 영승(迎勝) :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사신을 이 마을에서 영접하고 환송하였으므로 영송(迎送)이라 하던 것을 중종 38년(1543)에 퇴계 이황 선생이 이곳에 살던 처외숙 전철(全轍)과 그때 여기에 우거(寓居)하던 장인 권질(權瓆)이 회갑을 맞게 되므로 이곳을 찾았다가 영승으로 고쳤다. 조선초에 정선에서 정선 전씨가 옮겨오고, 이어 광주 이씨(廣州李氏)가 서울에서, 선산 김씨가 함양에서, 파평 윤씨가 서울에서 각각 옮겨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영승리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제일 큰 마을이다.
- 계동(溪東), 초동(草洞) : 거열산성 밑 계전(桂田)골짜기 동쪽에 자리하므로, 또는 영천 냇물의 동쪽이라 하여 계동(桂東, 溪東)이라 하고, 숲을 치고 마을을 열었으므로 "섶풀" 또는 신벌(薪伐)이라고도 한다. 냇물을 가운데 두고 동쪽을 계동 또는 계전(溪東, 桂田)이라 하며 200여년 전에 창녕 조씨가 처음 살았다 하고, 서쪽을 초동(草洞) 또는 "어덕밑" 이라하고 150여 년 전 김해 김씨가, 뒤이어 성산 이씨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 장백(長白) : 마을 앞을 흐르는 위천천 주변에 긴 모래밭이 있었으므로 이름되었고, 무신란 때 해주 오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율리(栗里)
본 면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여 위천면 당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舊) 읍지(邑誌)에 의하면 예부터 이곳에는 율도(栗島)가 있었다고 한다. 율리란 명칭도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상율, 풍계, 장풍, 도동으로 나눈다.
- 상율(上栗), 도동(道洞) : 옛날 귀양살이 온 선비가 이 곳에 살면서 위천면의 진동암(鎭洞岩)을 댓섬, 영승 북쪽의 안갱이들을 조개섬이라 하고, 귀양살이 하는 사람은 섬에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곳을 "밤섬"이라 하였다 하며, 일제 때 상율로 고쳤다 한다. 달성 서씨가 터를 잡아 형성되었다. 도동(道洞)은 밤섬(上栗)과 위천면 당산(堂山)사이의 큰 길가에 있으므로 도동이라 하고, 매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매바우"라고 부르며 진양 강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풍계(豊溪), 장풍(長風) :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위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도 풍부해 "풍계"라 이름했고, 흔히 "핑기"라 부른다. 500여년 전 고성 이씨가 마을을 열었다 하며, 윗담, 아랫담, 삼태동(三胎洞), 장풍 등으로 이루어 졌으나 삼태동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 장풍(長風)에는 조선시대 역원인 장풍원(長風院)이 있던 곳이다. 안의(安義) 반락원(反樂院)에서 고학 쌀다리, 창촌 너들다리를 거쳐 여기에서 내를 건너 고제 높은다리,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길손이 쉬어가는 주막촌이 있었다.
월계리(月溪里)
마리면 서쪽 기백산의 동북동 능선에 솟은 오두산(烏頭山, 942m)와 영천과의 사이에 동남향의 터전에 자리한다. 월계는 월화(月華)의 월자와 월화, 학동, 토점에서 동쪽으로 영천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가닥의 시내에서 시내계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월화, 영신, 학동, 성락, 토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월화(月華) : 조선 선조 때(1601) 하빈인 월담 이정기(月潭 李珽期)가 남하 지산에서 아랫담에 옮겨 와서 그의 호에 '월'을 따고, 빛날 '화'자를 붙여 이름 지었다. 처음 아래터와 웟터골에 살다가 같이 모여살면서 "새말"이라 했다. 본래 고려말 조선 초에 한양 조씨가 웃담 건너담에 살다가 위천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 영신(迎新) : 400여 년 전 하빈인 이정기가 옮겨와서 "새터"라 부르다가 영승으로 가던 퇴계 이황 선생을 여기서 처음 영접했다는 뜻에서 영신이라 한다. 1948년까지 마리면 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었고, 일제 때 거창경찰서 마리면 주재소도 이 마을에 있었다.
- 학동(學同) : 마을 서쪽 300미터에 있는 산(시루봉)에 흰 바위가 있어 백암(白岩)이라 하다가, 서당골에서 글공부를 하였기에 "학동"이라 하였다. 일제때 배움골이 배암골 사동(蛇同)으로 불러 오던 것을 1992년 "학동"으로 바꾸었다. 풍수설에 이 마을터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은 형국이라 사동이라 하고, 뒷산이 황새봉(鶴峰)이므로, 황새가 뱀을 해치지 못하게 마을 가에 숲을 길러서 마을을 가리게 한다는 설이 있다. 정선 전씨가 영승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별똥이 떨어졌던 곳이라 성락(星洛)이라 하였고, 옛날에는 영천 물이 이 마을 터로 흐르는 곳에 소가 있었고, 그 소에 별이 떨어져 "벼락소"라고 하였다. 1945년 거창 유씨가 처음 터를 열었다.
- 토점은 옛날에는 "작은 등골(小登谷)"이라 하였는데 1670년대에 옹기를 굽는 가마가 생겨서 "옹기골"이라 하다가 토점으로 바꿨다. 진양 하씨가 처음 터를 열었다.
말흘리(末屹里)
본 면의 한가운데 자리하며 고학에서 내려오는 주암천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말흘은 마을과 관청의 옛말 "마을"에서 나왔고, 가야시대 이 근처의 부족을 다스리던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으로 여겨진다. 진산, 지동, 주암, 재음, 창촌, 원말흘, 송림 7마을이 있다.
- 진산(進山) : 면사무소, 지서, 단위농협, 마리우체국, 마리초등학교, 마리중학교 들이 있다. 옛날에는 "지동 아랫담"이라 하다가 마을 뒷산인 마이봉(馬耳峰)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 진산이라 하고 "진살미"라 부른다.
- 지동(池同) : 옛날 백제로 사신을 보내면서 꼭 돌아오라는 뜻에서 회동(回洞), "도롱골"이라고 하였다. 마을 동쪽 뒷산이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고, 남쪽에서 북으로 뻗은 앞산을 구유(구시)등이라 하며, 남동쪽산은 속초봉(束草峰)이고, 앞 개울이 구유 앞을 흐르는 형국이므로 1928년에 못을 파서 소가 물을 마시게 하고 이름을 지동(池同)으로 고쳤다.
- 주암(舟岩), 재음(才陰) : 마을 뒤편 소류지 우측 작은 산아래에 배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배바우"라 하고 그바위에 주암(舟岩)이라 새겨져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 재음은 이로재(履露齋) 위 산골짜기에 있다. 옛날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독점"이라 하다가 재음으로 이름 하였다.
- 창촌(倉村) : 안의현의 동창(東倉)이 있었으므로 "창말"이라 불리다 창촌으로 고쳤다. 200여 년 전 전주 이씨가 거창읍 국농소에서 옮겨 왔다고 전한다.
- 원말흘(元末屹), 송림(松林) : 말흘리에서 가장 크고, 먼저 생긴 마을이다. 옛날에는 "먹골 , 오곡(梧谷)"이라 하다가 일제 때 원말흘이라 하였다. 신라 때부터 있었던 송림사(松林寺)에서 마을 이름이 생겼다. 150여 년 전에 정선 전씨가 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고학리(皐鶴里)
본 면의 서쪽끝에 솟은 기백산의 동남기슭에 자리하여 남동쪽 함양군 안의면과 경계한다. 가야시대 마리(馬利)에 따랐고, 마리는 머리(頭, 首)의뜻으로 부족장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한다. 8세기 통일신라 때 천령군 이안현(天嶺郡 利安縣)이 되었다가 14세기말 고려 고양왕 때 감음현(感陰縣)에 속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음, 안의현의 남리면 소 재지가 되었다. 높은 언덕 앞에 세 봉우리가 솟아 있고, 개울물은 새 '을'자로 모여 흐른다. (高阜前庭 三峯立 泉水合流乙字溪)라는 글귀모양 첩첩산중에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다. 고학은 높은 언덕이며 풍수설의 산세 모양에서 높을 '고'자, 새 '학'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병항, 고신, 고대, 상촌 4개 마을이 있다.
- 병항(柄項) : 마을의 동쪽 당봉(堂峰)의 자라바위와 서쪽의 자라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중앙의 목넙 고개터에 자리하고 있어 자래목이라 하다가 일제때 병항으로 고쳤다. 400년전 해주 오씨 구화 오수의 후손들이 터를 열었다고 한다.
- 고신(皐新) : 약 400년전 띠말리촌(茅旨村)에 해주 오씨가 살기 시작했으나 땅이 높고 경사가 급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였고, 산사태로 바위가 무너져 위태로워지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고학에 새로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고신(皐新)이라 칭하다가 일제때 고신(告新)으로 했던 것을 다시 고신(皐新)으로 개칭하였다.
- 고대(皐大), 상촌(上村) : 신라초에 마리현의 치소가 있었다 하고, 안의군 남리면(고학리, 대동리, 하고리)의 소재지며 고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어서 고대(皐大)라 불렀다가 일제때 고대(告大)로 했던 것을 다시 고대(皐大)라 개칭 하였다. 창녕 성씨가 처음 입동 하였으며 이어서 광산 노씨, 파주 염씨, 평산 신씨가 입동 하였다 한다. 상촌(上村)은 고학리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여 상촌이라 하며 양씨, 이씨가 처음 터를 열었다 한다.
대동리(大東里)
본 면의 서쪽 끝 기백산에서 바래기(反樂)재까지 뻗은 능선은 그대로 남동진하여 안의면 귀곡리, 초동리와 경계를 이루고, 한 가지는 동북진하여 말흘리로 향하는데 이 두 산줄기의 동남쪽 골짜기와 서쪽 부분이 대동리다. 대동리는 옛 동리면의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5개 마을이 있다.
- 신기(新基), 삼거리 : 마을 남쪽 황새들과 북쪽 황새밭들 중앙에 위치한 알자리 터라 하여 봉기(鳳基) 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안의군 남리면 새터를 근래 신기라 고쳤다. 영양 천씨가 처음 터를 열었다. 삼거리는 옛날 안의, 거창, 위천으로 향하는 삼거리 분기점으로 이름 하였다.
- 시목(柿木), 서편(西便) : 마을 앞산이 관악산(冠岳山)이고, 옆산은 관하산(冠下山)이며, 두 산의 남쪽에 자리하므로 관남동(冠南洞). "감남말"이라 하다가 일제 때 시목이라 하였다. 약 300년전 진양 강씨와 진양 하씨가 비슷한 시기에 등어 왔으며, 창년 성씨가 서편마을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 서편은 마을 앞 불마개울과 역마두 서쪽에 있으므로 서편이라 하고, 서평(西坪)이라고도 하였다. 창녕 성씨가 터를 닦은 이후 합천 이씨가 위천 강천에서 옮겨 왔다.
- 엄대(嚴大) : 마을 뒷산이 엄정하게 뻗어내려 대와같이 생겼다 하여 엄대(嚴台) 또는 산골의 그늘진 곳이라 하여 엄대(陰垈)라 했다 고 하고, 또는 마을에 살던 반남 박씨 문중에 효성이 지극하고 행실이 엄하고 단정하여 엄대(嚴大), 그가 사는 곳을 "엄정골"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처음 전씨, 허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 동편(東便) : 마을 앞을 북쪽으로 흐르는 불마개울의 동쪽에 있으므로 동편이라 하고, 동평(東坪)이라고도 하였다. 송씨, 김녕 김씨가 처음 들어 왔다고 한다.
하고리(下高里)
마리면의 동남단에 솟은 662cm의 망덕산(望德山) 서북 기슭에 자리하며 동쪽은 거창읍 송정리, 남쪽은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와 맞닿인다. 하고는 아래에 있는 소곡과 높은 곳에 있는 고창(高昌)을 아울러서 일컬는 말이다. 고창, 세동, 소곡 3개 마을이 있다.
- 고창(高昌), 세동(細同) : 하고리의 높은 재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고치이"라 하다가 고창으로 고쳤다. 윗담, 아랫담인 상고(上高)와 하고(下高) 두 담으로 나눈다. 상고창은 동래 정씨가, 하고창은 거창 신씨가 이주하여 살고 있다. 세동은 지금 마을의 북쪽 400m 멀미양지골에 허씨가 살았다 하고, 북쪽 600m 구부골(具富谷)에 구씨라는 부자가 아들 8형 제를 기르며 살았다 하며, 뒤이어 안의 귀곡에서 합천 이씨가 옮겨와서 5가구가 살면서 오가리라 하였고, 고창 옆에 있으므로 고치의 옆대기 라고도 했으며, 집이 늘어나면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하여 가는골 세동이라 했다.
- 소곡(巢谷) : 마을 뒤편 노송에 학이 살았으므로 소학실(巢鶴谷)이라 부르다가 소학실이 와전되어 씨악실이 되고 지금은 소곡으로 부르고 있다. 일설은 마을 앞을 흐르는 영천이 씨아의 손잡이 모양으로 구부러졌으므로 씨악실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청송 심씨, 장수 황씨가 터를 열었다고 한다.
===============================================================
웅양면(熊陽面)
본 군의 중앙부 북단에 자리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와 맞닿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남쪽에 웅양방 또는 웅양면이라 하여 동변리(東邊里), 신창리(新倉里), 화동리(和洞里), 죽림리(竹林里) 등 5개 리를 두었고, 북서부는 적화현방(赤火 峴坊)또는 적화면(赤火面)이라 하여 아주리(鵝州里), 대현리(大峴里), 취송정리(翠松亭里) 등 3개 리가 있었는데, 지금 은 이곡을 적화, 적하, 하성(赤火, 赤霞, 霞城) 등으로 부른다. 1914년 2개 면을 합하여 웅양면이라 한다. 본 면의 남쪽 주상면 성기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 곰이 누워있는 모양 같 아 와웅산(臥熊山) 또는 곰내뫼, 웅남(熊南)이라고도 썼다가 양지바른 따뜻한 곳이라 하여 웅양이라 한다. 지금은 동호 리, 죽림리, 노현리, 산포리, 군암리, 신촌리, 한기리 등 7개 리로 나눈다.
동호리(東湖里)
동호와 성북으로 나눈다.
- 동호, 뒹편 : 삼한시대부터 옛터라고 하며, 본 면을 남북으로 흐르는 미수천(渼水川)의 동쪽에 자리하므로 동변리(東邊里)라 하다가 19세기 초 순조 때 이곳에 살던 진사 이지유(李之裕)의 호를 따라 동호리라 하였다. 이 마을은 쳉이(키)설이라 하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 수록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성북(城北), 잣뒤 : 옛날에는 용바위가 마을 뒤에 있으므로 용호동(龍湖洞)이라 하였다.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므로 마을을 아래로 옮겨 성 재 북쪽에 자리하게 되어 성북 또는 "잿뒤"라고 부르던 것이 "잣뒤"가 되었다.
죽림리(竹林里)
운평, 구암, 유령, 죽림 등 4개 마을이 있다.
- 운평(雲坪), 굼들 : 마을이 낮은 들 가운데 자리하여 늘 안개가 많이 끼어 구름들 '굼들'이라 한다.
- 구암(九岩), 구지바우 : 마을 어귀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어 거북 '구'자 구암(龜岩)이라 하다가 바위가 여러 개 있으므로 아홉 '구'자 구암으로 바꾸었다. 흔히 "구지바우"라 한다. 400여 년 전 우씨가 창동했다고 전한다.
- 유령(楡嶺), 누록재 : 옛날 마을 둘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통하는 재를 느릅나무재라고 한데서 누룩남재, "누룩재" 라 부르게 되었다.
노현리(老玄里)
노현, 원촌, 화동 세 마을로 이루어졌다.
- 노현(老玄) : 노금지재 밑에 있으므로 "노금동"이라고 하며, 노현은 노금지재의 한문 표기 노나라 '노'자, 줄풍류 '현'자(魯絃)에서 생긴 것이다. 임진왜란 때 동래 정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 원촌(院村), 장터 : 사액서원인 포충사(褒忠祠)가 있기에 원촌이라 하고, 시장이 있으므로 "장터"라고도 한다.
- 화동(和洞), 화동골 : 원촌에 따른 작은 마을로 화촌재(和村齋)가 있어 화촌, 화동골이라고 했다.
산포리(山圃里)
산포, 석정, 우랑, 강천, 금광, 어인 여섯 마을이 있다.
- 산포(山圃) : 산과 물이 좋아서 산수동(山水洞)이라 하다가 산포로 바꿨다. 옛날 탁, 허(卓, 許) 두 성씨가 살았다 하며, 1795년께 청산현감을 지낸 연안인, 이지순(李之淳)이 옮겨 왔다고 한다.
- 석정(石亭), 돌정지 : 마을 앞에 돌덤과 정자 나무가 있으므로 "돌정자"라고 한다.
- 달맞이 재(望月峰) : 마을 뒤 북쪽에 있는 산이다. 정월 보름에 부부가 함께 달맞이를 하면 아들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 산의 중턱을 지나 장교마을, 용전마을로 통하는 산길이 있다. "무학재"라고 한다.
- 우랑(牛郞) : 뒤에 있는 백암산(白岩山)을 양각산(兩角山)이라 하고, 풍수설에 쇠불알설이라 하여 우랑이라 하였다.
- 강천(江川), 장다리 : 하성, 금광, 우랑에서 흐르는 세 갈래 물이 어울리므로 강천이라 이름 했고, 흔히 "장다리"라고 한다.
- 금광(金光) : 마을 근처 산에 금이 많이 묻혀있다 하여, 또는 산의 바위에 늘 물기가 있어서 햇빛이 번쩍이므로 생긴이름이라 한다.
- 어인(於仁) : 어진 사람이 많이 날 것이다 하여 이름되었고, 경상북도와 경계이 있다. 우두령에 자리하므로 우두령(牛頭嶺)이라고도 한다.
군암리(君岩里)
용전, 구수, 군암, 송산 네 마을이 있다.
- 용전(龍田) : "아침터"라고 하며 엄씨(嚴氏)가 마을을 열었다고 전한다. 용이 밭에 앉은 형국이라 이름하였고, 앞산은 오리가 알을 품을 형태라 한다.
- 구수(口水) : 풍수설에 뒷산은 소와 같고, 마을은 구유 형국이라 구유통 "조"자 조동(槽洞)이라 하며 구유의 사투리 "구시"가 구수로 바뀌었다.
- 군암(君岩), 군대암 : 마을 앞산에 스승바위가 있어서 스승부자 바위 '암'자 부암(傅岩)이라 하다가, 임금바위로 이름을 바꿔 군대암(君大岩)이라 한다.
- 송산(松山) : 마을 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송징이"라 하다가 송산이라 한다. 한 300여 년 전에 동래 정씨, 기계 유씨, 남원 양씨가 들어와서 마을이 되었다고 전한다.
신촌리(新村里)
아주, 신촌, 왕암, 진마루 네 마을이 있다.
- 아주(雅州) : 적화현방 때 아주리였다. 거위설이 있어서 거위 '아'자 아주(鴉州)라고도 쓰며, "아줏골"이라 부른다.
- 신촌(新村) : 새로 생긴 마을로 "신기촌(新基村)"이라고도 하며, 적화현방의 소재지였다. 뒷날 적화면사무소 소재지가 되었고 지금도 "사무실터"가 있다.
- 왕암(王岩) :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 "왕바위"가 마을 이름이 되었다.
- 진마루(長旨 장지) : 청룡(마을로 올라가는 낮은 산)의 날등이 길고 마을이 높은 곳에 있어 장지(長旨)라 불리던 것을, 2015년 3월 25일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의 이름인 진마루로 변경하였다.
한기리(汗基里)
원오산, 신오산, 백학동, 하곡, 한기 다섯 마을이 있다.
- 오산(吾山) : 옛날 큰 오동나무가 있었으므로 오동 '오'자 오산(吾山)이라고 썼다고 한다. 원오산이라고도 부른다.
- 신오산(新吾山) : 오산 마을 동쪽 100여 미터 떨어진 데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백학동(白鶴洞)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으로 통하는 "배터고개"에 자리하고 학모양으로 생긴터라 하여 이름되었다.
- 하곡(霞谷) : 마을 뒤에 있는 거말산(巨末山) 이름을 따라 "걸머리"라고 한다.
- 한기(汗基) : 경상북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높이 875미터의 국사봉(國師峰) 남쪽 기슭에 자리하며, "큰재"라는 뜻에서 대현리(大峴里)라 하다가 원한기(元汗基)라 부른다.
==========================================================
1 전체
